
언스플래쉬
봄이 오면 소풍을 많이 다니겠노라, 호기롭게 한 다짐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미세먼지 탓이다. 괜찮은가 했더니 오늘 다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소득이 없어 시무룩해진 도둑처럼 집밖으로 나온다. 슈퍼에 들어가 과일을 살펴본다. 좀 비싸다. 싸고도 실한 과일은 없나? 두리번거리는데 가게 주인의 말.
“애기 엄마, 오늘 딸기 세일이에요”
태연하게 과일을 고르는 척 하지만 당황한다. 딸기 쪽은 아예 보지 않는 것으로 소심하게 불만을 내비친다. 내가 어딜 봐서 아기 엄마야? 불만을 가지려다 그만 둔다. 아이는 없지만 있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다. 미처 깨닫지 못한 내 모습, 나만 모르는 나, 그런 건 항상 남이 깨우쳐준다. 구미가 당기는 과일이 없어 도로 나온다. 어깨엔 도서관에 반납할 책이 한 짐이다.
아직 도서관에 갈 마음이 없다. 마스크 안에서 호흡을 쌕쌕이며, 전진한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순으로 피어난 꽃들. 아직 꽃 피지 않은 벚나무가 더 많지만 머지않아 죄다 필 것이다. 어쩌지? 저것들이 다 피면 어쩌나? 어쩌긴 뭘 어쩐단 말인가! 아아, 감탄하겠지. 꽃이 우르르 피어나면 그 황홀함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좋으면서도 조바심치는 건 내 취미다. 목련나무 앞에 멈춰 선다. 겨우내 이 나무가 목련나무인 줄 모르고 지나다녔다. 언제 이 뾰족하고 부드러운 것이 돋아난 걸까?
아직 도서관에 갈 마음이 없다. 동네 카페 ‘식물도감’에 들어간다. 커피맛과 주인 마음씨가 일품인 곳이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인아주머니와 수다를 떨면서, 새로 들어온 봄옷과 린넨 소품을 구경한다. 살 마음은 없었는데(정말?) 짙은 초록색 린넨 셔츠와 행주를 사기로 한다.
커피와 새로 산 셔츠와 책 보따리를 끌어안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예닐곱 살 즈음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우르르 몰려나온다. 마스크를 쓴 아이가 대부분이지만 몇몇은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간다. 저 아이들에게 봄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기억될 것이다. 문득 서늘하다.
도서관에도 단골이 있다. 자주 보던 사람들이 앉아있다. 낯은 익지만, 그 밖의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눈이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고, ‘저이가 또 왔군’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들. 태평한 자세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는 읽거나 끼적이거나 끔뻑끔뻑 조는 사람들. 나도 그 중 하나다. 자리에 앉아 시집을 읽는다.
“모든 나무가 지구라는 둥근 과녁을 향해 날아든 신의 화살이었다 해도”
(신용목 시 ‘절반만 말해진 거짓’ 中)
이 구절에서 진심으로 놀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감탄’하기 위해 읽는 것이 시다!
창밖을 보니 미세먼지를 뒤집어 쓴 신의 화살들이 비스듬히 서있다. 지구가 한 덩이 사과라면, 저 나무는 신의 화살이고, 나는 소풍을 가지 못해 시무룩한 얼굴로 시를 읽고 있는 미세먼지다. 그렇다. 지구 입장에선 나도 미세먼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슈퍼에서 청송사과를 한 봉지 샀다. 청송은 여기서 얼마나 먼가? 예전에 누가 나보고 청송사람 아니냐고 끈질기게 물었는데(아니라고 해도!), 그이는 잘 있나? 청송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
목련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나리도 개나리대로 하루치 봄을 사는 중이다. 오늘은 내 하루치 봄날이다.

박연준(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덕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속눈썹이 지르는 비명』『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가 있고, 산문집『소란』을 냈다.









![[윤경희 칼럼] 인 메디아스 레스 II (사건의 한가운데서 II)](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8-ac1ea350.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울퉁불퉁 과자세트 같은 단편만화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8-49b98b62.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선물 같은 날들이 펼쳐지기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2df351e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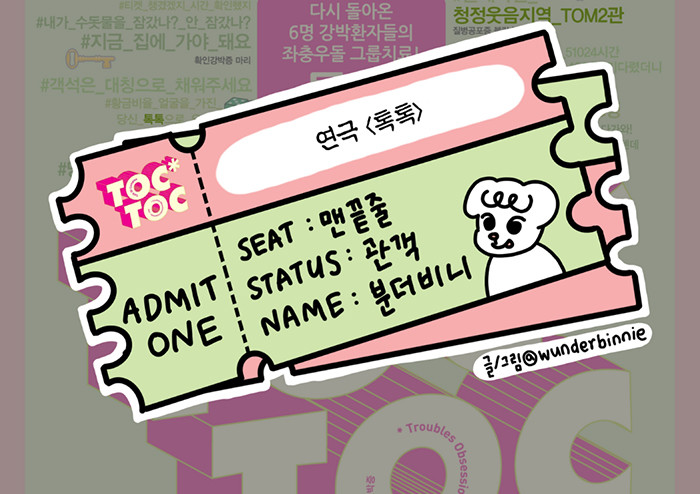


시골아낙
2018.04.06
iuiu22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