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대학 초대 총장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그는 메이지천황의 개인 강사가 되어 독일의 국가학에 기초한 일본국을 세우려 했다. 당시 그에게 천황은 근대국가를 이뤄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군부와 우익 세력의 공격을 받자 변절하여 자신의 생각이 망상이었다며 과거의 주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다. 학자로서의 신조를 버렸지만, 그 후 도쿄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근대적 학제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 식민지화에 대한 일본의 욕심은 어떻게 구체화되었나?
세계평화와 관련해 영국과 러시아라는 ‘상수’와 더불어, 독일과 일본이라는 ’변수’를 지적한 매킨더의 예언이 발표되고 2주 후, 러일전쟁이 발발한다. 러일전쟁은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러시아와 해양세력(영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과의 전쟁이다. 영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 했다. 사실 일본은 매킨더가 생각한 해양세력의 주요 멤버는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매킨더가 세계권력 질서의 주요 멤버로 포함시키기에는 아직 그리 대단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정학과 관련한 러일전쟁의 의미를 다루기 전에, 일단 일본 내의 지정학적 사고의 도입과 변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우스호퍼의 ‘레벤스라움’이 본격 소개되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일본에는 유럽의 지정학적 개념이 이미 다양한 경로로 소개되었다. 앞서 자주 등장한 개화기 일본의 대표적인 독일파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이 맥락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888년 말, 평생 경쟁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로 있던 내각의 내무대신이었던 야마가타는 선진국의 지방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
1889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던 그는 빈 대학의 ‘국가학(Staatswissenschaft)’ 권위자인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 1815~1890)을 만난다. 국가학이란 독일 특유의 학문으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의 ‘정치학’에 해당한다. 민족국가 형성이 뒤처졌던 독일에서는 국가 주도의 제도 형성에 관한 논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활발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국가의 체제 유지와 연관된 ‘법학’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개화기의 일본은 주로 독일법을 받아들여 근대국가 체제를 갖춰나갔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또한 독일법을 적극 수용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서 독일법학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서 독일 유학파 가운데 그나마 교수 채용 비율이 높은 분야가 바로 법학이다. 철학이나 사회학 분야도 드물지만 교수로 채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 외 다른 분야는 아주 형편없다.)
독일 국가학을 대표하는 스위스 태생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 요한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가 1869년에 쓴 책 『Das moderne Volkerrecht der Civilisi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문명국가의 근대 국민법)』은 한국과 일본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1880년 중국에서 ‘공법회통(公法會通)’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1896년, 이 책은 조선에서 재편집되어 같은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당시에 입법, 관제, 군대, 외교와 관련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공법회통’을 참조해 만들어졌다. 일본 또한 독일의 국가학을 적극 수용했다. 물론 대한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빨랐다.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가 블룬칠리의 1852년 저서인 『Allgemeines Staatsrecht(일반국법)』 을 『국법범론(國法汎論)』이란 제목으로 1872년 번역 출간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1880년 번역된 블룬칠리의 책 『공법회통』은 중국인의 번역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1827~1916)이 한자를 익혀 청나라에서 한역(漢譯)한 것이다. 일본은 그만큼 빨랐다.
중국에 머물던 윌리엄 마틴은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책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국제법의 요소)』를 1864년 한역하여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1868년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조선에는 1880년에 알려졌다. 『만국공법』은 당시 아시아 국가들에게 서구의 국제법을 이해하는 기본 교과서 역할을 했다. 국가체제 형성과 관계된 국가법은 독일법이, 외교와 관계된 국제법은 영미법이 아시아에 도입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먼저 독일어를 익힌 가토 히로유키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 정부를 독일의 국가학에 기초하여 세우려 했다. 그는 1870년부터 천황의 개인 강사가 되어 독일의 국가학을 천황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1877년 히로유키는 도쿄 대학의 전신인 개성학교의 총장을 맡았다. 오늘날 그는 도쿄 대학 초대 총장으로 여겨진다. 가토 히로유키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민족’, ‘국민’과 같은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는 독일어 ‘Nation’을 ‘민종(民種)’으로, ‘Volk’를 ‘국민(國民)’으로 처음 번역했다. ‘민종’은 이후 다른 일본 학자들에 의해 ‘족민(族民)’ 혹은 ‘민족(民族)’으로 수정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독일어 ‘Nation’과 ‘Volk’는 맥락에 따라 ‘민족’과 ‘국민’으로 뒤섞여 번역된다.) 히로유키는 블룬칠리의 ‘민족’과 ‘국민’ 개념에 기초한 국가론에 따라 천황제 중심의 근대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블룬칠리는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봐야 한다는 당시의 사회진화론적 국가론을 대표하는 학자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1889년 만났던 빈 대학의 슈타인 교수는 블룬칠리의 ‘유기체-메타포(Organismus-Metapher)’를 더욱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인물이다. ‘국가의 육체는 영토’이며, ‘국가의 정신은 민족(das Volk)’이라는 슈타인의 주장은 이 같은 유기체-메타포의 핵심 내용이다.
야마가타가 슈타인을 만나기 7년 전인 1882년 8월, 이토 히로부미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슈타인을 찾아가 메이지헌법 제정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 이미 은퇴한 교수였던 슈타인은 이토 일행에게 몇 달에 걸쳐 권력분립의 기본구조, 국가가 실행해야 하는 사회정책 등과 같은 근대국가에 관한 강의를 했다. 아울러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 제국의 비스마르크 수상으로부터 베를린 대학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 1816~1895) 교수를 소개받아 독일 제국 헌법을 자세히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수년 전 이토 히로부미가 슈타인으로부터 메이지헌법 제정을 위한 조언을 받았다면, 1889년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슈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아주 희한한 지정학적 개념을 듣게 된다. 이른바 ‘권세강역(權勢疆域)’과 ‘이익강역(利益疆域)’이다.
독어 ‘Machtsphare’의 번역인 ‘권세강역(權勢疆域)’은 오늘날 표현으로는 ‘권력영역’이다. ‘이익강역(利益疆域)’은 ‘Interessensphare’의 번역으로 ‘이익영역’이란 뜻이다. 권세강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뜻하고, 이익강역은 국가의 권세강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완충지대를 뜻한다. 달리 표현하면 한 국가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접국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야마가타는 슈타인을 만나자마자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일본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당시 아시아에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여 남하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실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2년 후인 1891년에 착공된다. 그 때까지 일본은 러시아의 위협이 먼 바다를 통해서만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베리아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고, 러시아 함대가 그곳에 배치된다면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은 아주 직접적이고 치명적일 것이라고 야마가타는 생각했다.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교수였던 슈타인은 국가 유기체론을 주장했다. ‘국가의 육체는 영토’이며 ‘국가의 정신은 민족(das Volk)’이라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슈타인에게 메이지헌법의 기초를 배웠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권세강역(權勢疆域, Machtsph?re)’과 ‘이익강역(利益疆域, Interessensph?re)’이란 개념을 배웠다. 권세강역과 이익강역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슈타인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일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야마가타를 안심시킨다. 선로가 하나뿐인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수송할 수 있는 병력이 일본을 위협할 만큼의 인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는 얼어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본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한다. 슈타인은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은 다른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일본열도에 직접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나,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조선을 침략한다면 일본의 상황은 아주 심각해진다고 했다.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와 동해안의 항구를 점령하여 해군기지를 설치하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이다. 슈타인은 동해안 원산 앞바다의 ‘영흥만’이라는 장소까지 콕 집어 야마가타에게 겁을 주었다. (카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년.)
러시아의 한반도 점령은 일본의 이익강역이 불안해진다는 것을 뜻했다. 이익강역이 불안해지면, 바로 일본의 권세강역 또한 불안해진다. 슈타인은 야마가타에게 일본의 권세강역, 즉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익강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한다. 슈타인이 지적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익강역은 조선이었다. 슈타인은 일본이 이익강역으로서의 조선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직접 점령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러시아나 청나라와 불필요하게 부딪힌다는 것이다. 대신 조선을 중립국이 되도록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당시 강대국들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외교적 전략을 제시했다. 사실 조선을 어떻게든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떼어놓겠다는 전략은 ‘정한론(征韓論)’ 이후의 일본 정치가들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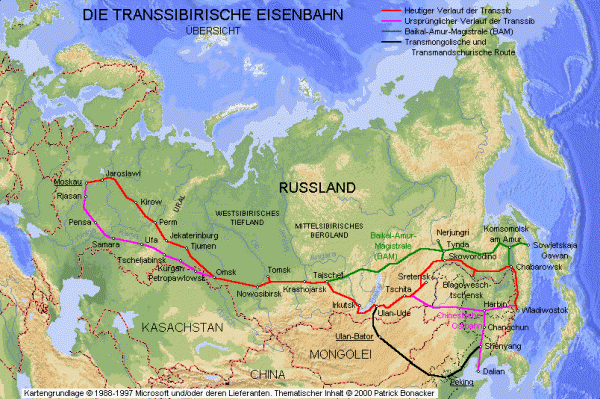
시베리아 횡단열차. 분홍색 선은 1891년 당시 러시아가 계획했던 원래의 노선이고, 빨간색은 오늘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다. 슈타인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동해안의 항구까지 연결되면 일본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조선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겠다는 ‘정한론(征韓論)’은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정한론의 빌미는 당시 조선 정부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막부체제가 종식되고 왕정복고(王政復古)가 되었다는 것을 조선정부에 알리고,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논의하고자 사신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일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외교적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했다. 일본이 보낸 외교문서에 청나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황(皇)’이나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칙(勅)’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외교적 접근이 차단된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무력행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한론의 시작이다. 이 같은 정한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자는 사이고 다카모리였다.
메이지 정부 인사들의 격론 끝에 정한론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자, 사이고 다카모리는 메이지 정부에서 물러나 낙향한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섣부른 군사적 정한론은 반대했지만 조선을 어떻게든 청나라의 영향권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일본 정치가들이 공유하게 된다. 1877년, 고향에 머물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반란을 일으켜 세이난전쟁(西南戰爭)을 일으켰지만, 정부군에 의해 반란은 진압되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결한다.
다카모리가 반란을 일으키기 1년 전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맺어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첫 국제법적 조약이었던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에 맺어졌다. 정식 명칭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인 강화도조약의 첫 번째 조항은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선언은 언뜻 보면 아주 당연한 전제처럼 보인다. 왜 일본은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양 국가가 처음으로 맺는 조약에 명시하려고 했을까?
당시 조선의 외교적 권한은 철저하게 청나라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화도조약 또한 청나라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이 고종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이때 이홍장은 조선이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을 대비해 다른 서양 열강과도 근대적 조약을 맺으라고 권고한다.
일본이 조선과 맺은 첫 조약에 ‘조선국이 자주국가’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청나라의 영향권에서 조선이 벗어나야만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선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조선이 타국과 맺는 국제조약에는 매번 조선이 자주국가임이 선언된다. 일본은 강화도조약의 근거로 앞서 언급한 헨리 휘튼의 책 『만국공법』을 언급한다. (당시에는 ‘국제법’이란 단어보다 ‘만국공법’이 더 널리 쓰였다.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이란 단어가 만국공법을 대신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서양식 제복을 입은 일본 대표와 전통 의상의 조선 대표의 모습이 사뭇 대조적이다. 일명 ‘강화도조약’의 첫 번째 항목은 ‘조선국이 자주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당연해 보이는 이 같은 내용이 조선이 맺은 첫 국제 조약의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이유는 당시 조선의 외교가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국이 자주국가라는 것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야 일본의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외국과 처음으로 맺은 근대적 국제 조약인 강화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같은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治外法權)’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선을 자주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서로 모순된다. 자주국가란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생명, 재산, 자유를 보장하는 문명국가임을 뜻한다. 그러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선의 법과 제도가 미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본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조선은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치외법권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1854년의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1858년의 ‘미일수호통상조약(美日修好通商?約)’에서 처음 다뤄졌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영사재판권’에 대한 요구를 큰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강화도조약 당시의 조선처럼 무지했기 때문이다. 치외법권과 더불어 관세를 해당 국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관세자주권의 부정’, 그리고 조약을 맺은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을 때, 해당 조약국도 그 나라와 동등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최혜국 대우’가 당시 일본이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의 내용들이다. 일본은 이처럼 얼떨결에 맺은 불평등 조약을 수정하고, 진정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조선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당했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체결하면서 약육강식의 국제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국제법은 도대체 언제부터 ‘법’이 된 것일까?
역사가들은 1648년의 ‘베스트팔렌평화조약(westfalischer Friedensvertrag)’을 국제법의 기원으로 여긴다. 주권국가, 영토국가와 같은 단어의 사용과 국가와 국가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 규칙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은 독일 지역을 무대로 벌어진 프로테스탄트 국가들과 가톨릭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유럽 최대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끝내며 맺어졌다.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의 시작은 종교 전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의 영토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이 무모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톨릭 국가의 대표들은 뮌스터(Munster)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국가의 대표들은 오스나브뤼크(Osnabruck)에 각각 모여 협상을 시작했다.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가 독일 북서부의 베스트팔렌 지역에 속한 도시들인 까닭에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이라 불린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평화조약. 독일 지역을 무대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과 가톨릭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지역의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의 평화 협상으로 종식되었다. 이때부터 국가들끼리는 서로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토국가’, ‘주권국가’ 개념이 생겨났다고 역사가들은 주장한다. 그때까지 국가 위의 권력이었던 ‘교황’과 같은 상위 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외교’의 룰이 중요해진 것이다. 국제법의 시작이다.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은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아니었다.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거의 모든 왕국, 제후국들이 참여해 지루한 협상 끝에 맺어진 조약이다. 협상 결과, 신성로마제국은 붕괴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력은 오스트리아 국경 내로 축소되었다. 독일 지역은 수많은 제후국들로 분열되었다. 독일의 근대국가 출발이 늦어진 이유는 바로 이 베스트팔렌평화조약 때문이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독립했고,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지역을 얻었다. 이후 프랑스는 절대왕정-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며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30년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으나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싸웠다.) 스웨덴 또한 북유럽의 맹주가 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베스트팔렌평화조약으로 인해 가톨릭 중심의 중세 질서가 와해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은 근대국가 체제의 토대가 마련된 기점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국가의 ‘주권’과 ‘통치권’의 개념이 이 조약을 통해 확립되었다.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 해당국의 결정권에 속하며, 다른 국가나 교회의 개입은 가능하지 않다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성립되었다. 각 국가에는 자신의 국경 내에서 ‘법률 선포와 해석의 권한’, ‘전쟁 수행의 권한’, ‘병사 징집의 권한’ 등이 주어졌다.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한’도 주어졌다. 각 국가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국가 간의 평등한 외교 관계를 자주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권국가들 위로는 그 어떤 상위 권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는 이때부터 세계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법’은 바로 이 같은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인 것이다.
베스트팔렌평화조약을 통해 근대국가 체제는 확립되었지만, 국제법과 관련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다. 주체가 명확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들 간의 협상 결과로 맺어진 국제법은 처음부터 그 해당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애매하다는 이야기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들을 서구 기독교 문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아주 자의적이고 암묵적인 합의가 이때부터 생겨난다. 다시 말해, 비서구권, 비기독교 국가들을 ‘주인 없는 땅’, ‘미개한 지역’으로 보고 먼저 차지하는 국가가 ‘임자’가 되는 황당한 제국주의, 식민지주의가 ‘국제법’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 발전이 단선론적으로 진행되고, 역사 발전의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은 아래쪽의 국가들, 즉 미개한 국가들을 일깨우고 이끌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정당화가 있었기에 타국의 식민지화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식민화를 해도 된다. 오히려 식민지화하는 것이 미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배후에도 이 같은 서구 제국주의의 논리가 깔려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한 것이다.
‘미개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작동하는 고유의 규칙과 규범이 무시되고, 서구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외법권이 요구되었다. 미개한 나라들은 문명국이 아니기에 ‘관세자주권’도 인정할 수 없었고, 서구 국가들 중 어떤 나라라도 먼저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 그 이외의 나라들도 동일한 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라는 불평등 조약의 국제법상 정당화가 이때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얼떨결에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한다. 일단 ‘서구 문명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구식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국가학’ 교수인 슈타인을 만나러 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근대적 군대도 프로이센을 흉내 내며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갔다. 뿐만 아니다. 서구인들의 일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명화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문명화’는 곧 ‘서구화’였다.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 1871~1873)과 같은 대규모 시찰단이 수시로 파견되어 서구의 문화를 자세히 기록해 돌아왔다. 일본인들은 사절단이 보고한 내용대로 서구인들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정부가 1883년 도쿄에 2층 규모로 건축한 ‘로쿠메이칸’에서는 서양인들의 파티 문화를 흉내 낸 무도회가 매일 밤 개최되었다. 서양 댄스를 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문명국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로쿠메이칸(鹿鳴館)’. 일본은 서구 문명을 그대로 흉내 내야 국제법상 인정받는 주권국가가 된다고 생각했다. 도쿄에 로쿠메이칸이란 건물을 만들어 밤마다 무도회를 열었다. 서양인들은 비웃었지만 일본인들은 심각했다. 서양 댄스를 출 줄 알아야 문명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문명표준에 맞추기 위한 일본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 성공을 거뒀다. 서구 열강과 맺은 영사재판권은 1894년 이후 폐지되기 시작했고, 관세주권은 1911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서구의 국제법 울타리에 들어가려는 일본의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였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문화심리학자이자 '나름 화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에디톨로지> <남자의 물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현재 전남 여수에서 저작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정기현 칼럼] 어느 만만한 토성과의 조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5-9da5bf52.jpg)
![[인터뷰] 이금이, 역사의 행간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내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d41176b0.jpg)
![[구구X리타] 미래의 백과사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9-c2e023a6.jpg)

![[여성의 날] 도착하지 못하는 편지는 사라지는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cb50d7a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