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scandinaviandesigncenter.com
어린 시절 국민 학교에서(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자신이 없다) 배우길, 우리는 사계절을 가진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받아들였다. 환절기에 미묘하게 달라진 바람의 온도와 냄새는 늘 그맘때 즈음의 추억을 소환하는 반가운 정령이었고, 날씨 덕분에 우린 굶주리지 않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가끔 돌고 또 도는 계절에 무상함을 느끼기는 했었지만 서른이 넘기 전까지 한 번도 계절 변화를 불편이라 여겨본 적이 없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고급 호텔 체인 이름이 ‘Four Season’이겠는가.
때로는 연중 기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아열대 동네나 지중해성 기후를 안타깝게 여긴 적도 있었다. 물론 그땐 어리기도 했고, 저가 항공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발리, 괌, 하와이, 푸켓, 팔라우 등의 관광지를 다녀보기 전이었다. 태평양 환초 섬의 사실상 무한한 식량자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온화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와 같은 벼농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유승준으로 인해 눈을 뜬 웨스트사이드와 이스트사이드의 양단에서도 나는 랩퍼 이센스처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뉴욕 이야기에 뻑이 갔는데, 여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뉴욕 퀸스나 브롱크스의 음습한 골목길 힙합퍼들의 패션이 크게 한몫했다.
그러나 아웃도어 문화가 일상화되고 서핑이 패션의 코드가 되고, 바다 휴양지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사계절에 대한 신념은 바뀌었다. 이런 직간접적인 문화 체험을 떠나 날씨에 지치는 일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거칠어지자 사계절에 대한 찬미는 불신과 불편으로 뒤바뀌었다. 싱그럽다는 봄에는 옥상에다 빨래 한번 널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그득하고,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연간 최대최저 기온이 50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계절을 가진 날씨 덕분에 냉방을 하는 만큼 보일러를 떼야 하고, 안 그래도 좁은 집 장롱에 거위털 이불과 패딩 점퍼와 홑겹 린넨 침구와 민소매 탱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공기청정기가 필수 살림이 됐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래서 한겨울은 물론, 한여름에도 파랑, 노랑 초록으로 가득한 트로피컬 바이브를 꿈꾸며 여행 예약 사이트를 출근하듯 드나든다.
그런데, 이렇게 투덜거리다가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렘은 어김없이 시작된다. 특히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디딘 첫발에서 서늘하고 건조한 상쾌한 기운이 느껴질 때, 한여름에 찬물 샤워를 하다 다급히 온수를 트는 것처럼 직전의 불편했던 감정은 금세 잊고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참으로 간사하기 이를 데 없다.
가을맞이의 핵심은 패브릭이다. 고이 말아두었던 러그를 바꿔 깔고, 따뜻한 색상과 소재의 침구로 바꾼 다음 스프레드를 더 한다. 의자에 담요를 얹고, 벽에는 패브릭 장식을 설치한다. 질풍노도의 10대를 벗어났다면 방 벽에 영화 포스터나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대신 액자를 걸거나 패브릭으로 벽장식을 하는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나의 경우 블랙&실버로 이뤄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우승기를 걸어놓는다.

nuvomagazine.com
무엇보다 러그는 물리적인 인테리어 공사 없이도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아이템이다. 기능적으로도 필요하다. 현관 매트와 싱크대 앞, 침대 옆에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하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도 깔아놓으면 한결 보드라운 일상을 마주할 수 있다. 다만, 가격과 보관상의 문제로 매년 새롭게 마련할 수는 없으니 집에 들이기까지 꽤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아이템이다. 가격과 재질과 디자인이 워낙에 천차만별이고, 물성 상 다양한 제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그 어떤 스타일의 제품을 선택하든 돈은 조금 들이는 편이 낫다.
러그를 놓는 이유는 맨 바닥의 무심함을 잠시나마 탈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첫발을 밟았을 때 안온함이 발바닥 감촉으로부터 전달되어야 한다. 화장실이나 베란다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천연 염료와 오가닉 면이나 울로 만든 제품이 훌륭하다. 요즘은 스웨덴 브랜드 파펠리나와 같이 친환경 소재로 먼지날림과 진드기 걱정 없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직접 접촉해보는 편을 권한다. 즐겨 쓰는 브랜드는 에스닉한 로레나카날, 보다 깔끔한 펌리빙과 같은 북유럽 제품들이고 ‘루밍’ ‘짐블랑’ 등의 디자인 편집숍에서 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챕터원’, ‘구다모’와 같은 편집숍 사이트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요즘은 모로코, 페르시안이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꼭 따를 필요는 없겠다.
물론, 이보다 최대 10배 정도는 저렴한 이케아도 즐겨 찾는다. 시즌별로 가볍게 바꿀 수 있고, 싱크대 앞이나 세면대 앞에 놓을 작은 러그를 찾을 땐 이보다 훌륭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곳도 없다. 다만 얇은 러그일수록 밀릴 수 있으니 미끄럼방지 시트를 함께 사서 깔길 추천한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팬들턴이다. 가을과 겨울 침대에는 언제나 팬들턴의 ‘국립공원’ 라인 담요를 침대 스프레드로 쓰고, 러그로도 활용한다. 팬들턴은 미국 포틀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나름 유서 깊은 로컬 패브릭 회사로, 인디안 문양을 활용한 패브릭과 굿즈 등을 주로 만들어왔다. 그러다 2010년대 초반 미국발 맨즈웨어 열풍을 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다음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대중화를 하다보니 한창 매니아들이 열광할 때에 비해 한물갔다고 할 수 있지만, 집 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아직 팬들턴 만한 제품은 만나지 못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요 담요 라인은 여전히 미국 내 제조를 고수하고 있다.
참고로, 패브릭은 마냥 지켜보는 물건이 아니다. 인테리어 사진으로만 만날 땐 근사하고 따뜻한 아이템이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먼지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패브릭으로 집을 꾸몄을 경우 부지런한 청소가 요구된다. 장모로 만들어진 러그를 선호하지 않는 까닭이다. 우선 바닥 청소를 할 때 침구 청소도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도록하자. 다양한 침구 청소기가 시중에 있다만, 나의 경우 밀레 청소기에 미니 터보 브러쉬 헤드를 물려 먼지를 박멸한다.

김교석(칼럼니스트)
푸른숲 출판사의 벤치워머. 어쩌다가 『아무튼, 계속』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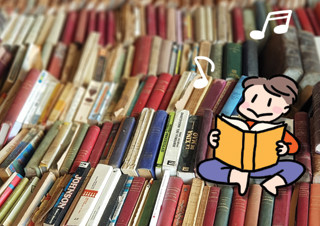




![[문화 나들이] 지천이 알록달록한 4월, 자연스러움이 그립다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4-0b8e7ac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