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향이 섞이는 일은 언제 가능할까? 나는 언제나 사람이 매개였다. 어느 날 갑자기 안 읽던 책이, 관심 없던 작가의 작품이 이유 없이 읽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읽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그때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책을 읽어 봐야겠다, 이제는 읽을 때가 왔다, 하고 떠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시차를 두고 나에게 온 책들이 있다.
박솔뫼 작가의 『인터내셔널의 밤』,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들이 그렇다. 박솔뫼 작가의 책은 언제나 신간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챙겨 읽어 왔는데, 『인터내셔널의 밤』은 어쩐지 출간 직후 바로 읽을 시기를 놓쳤다가 한참 뒤에 읽게 된 케이스다. 시간을 두고 읽었는데 이걸 놓쳤다니, 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았다. 이탈로 칼비노의 경우 함께 일하는 동료가 몇 년째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는 작가인데도 내내 읽어 볼 생각을 못하다가, 신기하게도 지난 연말에 갑자기 『반쪼가리 자작』을 들춰 보다 끝까지 읽게 되었고 이후 다른 책들도 몇 권을 연달아 읽기 시작했다.
답답하고 무력했던 한해, 밤에 잠들기 전에 칼비노 『모든 우주 만화』 속 단편들을 두세 편씩 읽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다. 이야기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현실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뻔뻔한 외할아버지를 가진 기분이었다. 지구랑 달이 가까워서 달로 달우유를 뜨러 가는 이야기나 행성이 멀어지기 전 하나의 점에서 온 마을이 생활하다가 한 여인이 조금만 공간이 더 있으면 너희들에게 맛있는 딸리아뗄레를 만들어 줄 텐데! 하고 외치자마자 우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실연 이야기가 많았다. 색깔이 없던 시대에 최초로 대기권 성층권이 생기면서 소리와 색깔이 생겨난 사건으로부터 불거진 연인의 이별 이야기, 물고기 할아버지의 손자가 사랑하는 육지 여자를 할아버지에게 인사시켜드렸다가 여자가 물고기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손자의 연적이 할아버지인 이야기. 이야기들은 깜깜한 밤의 폭죽 같았다.
늘 현실의 이야기, 곁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내 취향과 조금은 멀어 보이는 소설들. 그러나 시차를 두고 도착한 이 소설들을 잘 음미하다 보면 시간을 너울너울 감아 내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독일환상문학’, ‘고전환상소설’ 같은 수업명에 꽂혀 『장화홍련』과 『삼국유사』와 『걸리버 여행기』와 『모래 사나이』와 에드거 앨런 포의 모든 소설을 읽던 때…… 아침 9시에 시작하는 1교시 수업인 ‘동화와 꿈의 세계’를 들으며 정말로 반쯤은 (자느라) 꿈을 꿨고 그러다가 깨서 수업 자료인 샤를 페로와 에리히 캐스트너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들을 읽다가 너무 재밌다…… 하고 중얼거리다가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그 작가들의 책을 몇 권 더 빌려서 소파에 너울렁더울렁 몸을 걸치고 읽다 아직 안 깬 잠을 조금 더 자다가 다음 수업으로 향하던 때. 편집되고 각색되고 미화됐겠지만 대학교에서의 큰 즐거움은 그런 것들이었다. 내가 원래도 좋아하던 책이 대학수업의 중요한 교재였구나! 일석이조! 하고 읽은 것들을 또 읽고 또 다시 읽었던 일들. 독서를 여러 번 하면 정말로 내가 그 글과 문장을 갖게 된 느낌이라 좋았다. 그 이야기와 이야기에 쓰인 문장들에 익숙해지는 느낌이 좋았다. 대학교는 언제나 낯설었고 나는 너무 겁이 많은 나머지 서울로 몇 년을 통학했는데도 공간에 익숙해지질 않았다. 학교 주변 동네는 물론이고 학교 안도 마찬가지였다. 과방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모든 게, 누군가를 사귀는 일에 낯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종종 생각한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은 능숙해졌을까? 냉정히 말하자면 여전히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일, 타인의 취향으로 나를 넓혀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타인의 취향을 받아들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누군가가 좋다고 건네는 것을 지금 당장 기쁘게 펼쳐 보기도 하고, 아직 지금은 아니야 필요할 때 펼쳐 볼게 하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지금이다, 하는 확신이 들 때에 꺼내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꿈에 대한 것이다. ‘매일과 영원’이라는 에세이 시리즈를 함께하자고 말하기 위해 작가 미팅을 나갈 때면 작가들은 자신의 밤과 꿈, 잠과 불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걸 듣는 게 좋았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는 에세이의 꼴을 상상하는 동시에 나의 일상을 반추했다. 꿈이라면 지지 않고 많이 꾸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지. 작가들이 들려준 꿈 얘기를 한참 생각하다가, 나의 꿈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기억나는 몇 편을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

2020/12/8
꿈에서 렌즈를 꼈다. 흐릿하던 게 갑자기 또렷하게 보이는 현상이 꿈속에서도 생생해서 그 순간 놀랐던 것이 기억난다. 누군가 꿈이 컬러인지 흑백인지를 물었을 때 항상 당연히 컬러라고 생각해서 왜 그런 걸 묻지 싶었는데, 질문을 한 사람은 생각해 보면 그게 컬러가 아니래, 하고 대답했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깨어나서는 컬러인지 흑백인지 기억해 둘 만한 게 없나 생각해 보았는데 컬러인 것 같았다. 꿈속, 냉장고에 들어있던 햄버거가 컬러였던 게 기억났다.
2020/12/17
모의고사 같은 종합시험 보는 꿈을 꿨다. 시험 보는 꿈 얼마만인지. 꿈속에서도 나 대학 가지 않았나? 취직하지 않았나? 하고 당황했지만 막상 시험지 앞에 놓고 졸다가 풀다가 열심히 했다. 음악 시험도 있었고 가창 평가 같은 걸 해야 하는데 불러야 하는 노래도 잘 못 찾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준비 절차도 계속 못 알아듣고 허둥지둥했다. 점수가 깎일까 봐 꿈에서도 절절 맸다. 수학 시험도 있었는데 문제 정말 못 풀어서 앞사람 걸 컨닝했다. 아 잘 안 보여…… 하며 눈이 나쁜 탓을 꿈속에서도 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화진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장편소설 『동경』,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 『개구리가 되고 싶어』 등이 있다. 『나주에 대하여』로 제47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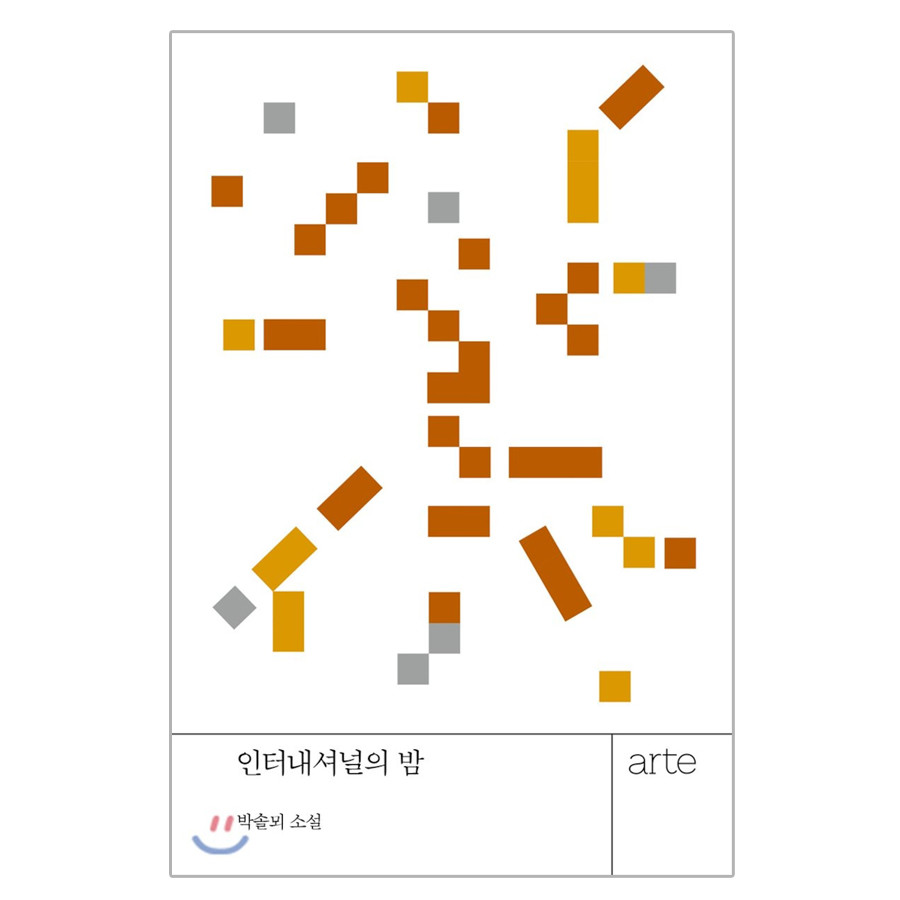
![[김화진의 선택 일기] 쓰는 것도 만드는 것도 처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d/a/7/6da7769b62b5fe21db432669fcfcc35f.jpg)
![[장강명 칼럼] 소설가의 에고서핑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1/e/f/81ef064d41af287a02eb00084a414ec8.jpg)
![[제목의 탄생] 왜 하필 이 제목이죠? (7)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0/d/c/a0dcacb0f1367c431a23c2cb4995a9be.jpg)

![[오정은의 미술과 문장] 조각의 피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0-c537b072.jpg)

![[김해인의 만화 절경] 이거 읽고 그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1ad97d18.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더뮤지컬] 김가람 작가, 세상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db5e43a3.jpg)









![[대여] 인터내셔널의 밤](https://image.yes24.com/goods/95752070?104x141)


바니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