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세상이 어둠에서 나온다. 잠에서 깨어나듯 서서히 감각 하나 하나가 깨어난다. 다시 생명이 눈에 들어온다. “어두울 때면 내가 죽은 것 같다.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클로드 모네가 이렇게 한탄했다. “빛을 더!” 죽음을 앞둔 침상에서 괴테는 이렇게 빌었다. 새벽은 빛의 샘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나날의 기원이다. 지구라는 하나의 배양접시에 담긴 66억 8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세포에, 정신에, 재탄생에 대한 무수한 비유에, 낮을 밝히고 밤을 헤쳐 나가기 위해 빚어낸 확장된 감각에 모두 햇빛이 어린다. 전기 덕분에 이제는 밤이 예전처럼 길지 않고 그만큼 어둡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느꼈을 공포감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별이 없는 밤이면 수족도 의지도 마비된 듯하고 존재가 작아진 것 같고 촉감에만 의존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야행성 포식자가 우리 뒤를 밟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맛 좋은 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약한 사냥감으로 전락한다. 선조들이 무력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망상에 시달리며 여덟 시간 동안 누워 있을 때에 얼마나 용기가 절실했을까? 한밤중 숲 그늘 사이를 누비는 우아한 밤짐승들은 무시무시하고 섬뜩하며 심지어 잔혹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밤을 악령으로 의인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불러오는 대가로 무엇이든, 부, 권력,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바쳤다. 생명으로 가득한 거대한 존재, 작물을 기르고 여행길을 인도하고 어둠에서 악령을 쫓아내고 삶에 다시 불을 밝히는 외눈박이 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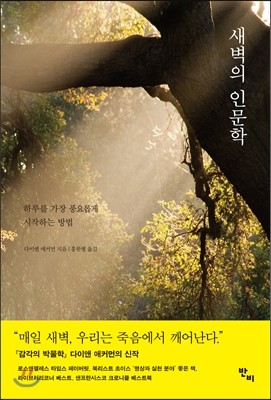
새벽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언제나 재탄생,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새벽을 맞는 와중에도 익숙한 일상과 근심걱정이 몰려들며 자기 좀 보라고 떠들긴 하지만. 깨어나는 동안 우리는 몽롱한 상태와 명료(이 말에도 빛[明]이 들어 있다.)한 상태를 오간다. 아침마다 이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이를 넘나든다. 정신의 절반은 안을 향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점점 밖으로 향하며 깨어난다. 이럴 때 “나 아직 그로기 상태야.”라고 말하곤 하는데, groggy라는 말은 18세기에 생겨난 단어로 럼에 취했다는 뜻이다. 조금 전까지 꿈속에서 헤매어 몽롱한 데다 여러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모호하고 그래서 위험한 시간이다.
눈꺼풀을 겨우 떼어 빛과 흐릿한 사물이 가물가물 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잊기 쉽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빛나기 시작한다. 길이 눈에 잘 들어오고, 먹이도 찾을 수 있고, 원기를 회복해 일도 쉽게 할 수 있다. 떠오르는 빛 속에서 나들문과 건널다리도 눈에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게 되지만 볼 수 있으려면 어쨌든 해가 지평선을 넘어서 쏟아져 들어와야만 한다. 해는 모든 사물에 빛의 방점을 찍고 우리 눈에 걸쭉한 노란 양분을 쏟아 붓는다. 다만 우리는 너무 바삐 사느라 삶 속의 자연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한다. 빙빙 도는 해, 달, 별들. 구름의 예언. 재잘거리는 새소리. 영롱하게 피어나는 이끼. 달그림자와 이슬. 늦여름에 다가오는 가을의 징조.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속살거리는 공기. 바람에 떨리는 나뭇잎. 동틀 녘과 해질 녘. 하지만 우리는 오래된 힘에 따라 무심히 살다 보니 변하는 시기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아 맞을 뿐이다.
 |
 |
겨울이 되어 햇빛이 약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만들고 창안해내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미국 북동부 지방 사람들은 퀼트로 만든 잠자리에서 일어나 철제 난로 안에 묻어놓은 불에서 나오는 열기로 몸을 데운다. 때로는 다른 생물에서 얻은 온갖 물건들을 입고 걸치고 밖으로 나간다. 발에는 고무나무 수액, 머리에는 염소 배에서 얻은 부드러운 털, 손가락에는 연하게 만든 소가죽, 그리고 상체에는 사람은 소화시킬 수 없으나 보온용으로 사용하고 식물은 연약한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포벽이 두꺼운 식물세포를 여러 층 덮는다. 다른 말로 하면 고무장화, 염소털 모자, 가죽장갑, 면 속옷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관절이 풀리고, 세포에 연료가 공급되고, 나른한 감각이 깨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엘크나 벌새처럼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아침 분위기도 조금씩 바뀐다. 겨울이라 한기가 다가오지만 양말을 올려 신을 정도는 아니다. 해는 지평선 위로 아주 약간 일찍 떠오르는데, 지구에서 이 부분이 아주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피칸 열매가 반짝이고, 금어초와 동백은 이슬에 흠뻑 젖어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새들은 수다쟁이 합창단이 노래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1월이 되면 북부의 새 합창단은 쿠카라차 마을, 그러니까 바퀴벌레 마을로 날아가고 없다. 바글거리는 벌레들을 비롯한 미물들이 날개 달린 손님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북부에서 헤어졌던 직립보행 유인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피한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겨울에 뜨거운 한낮의 땅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겨울에 꽤 멀리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들도 우리와 같이 그만큼 멀리 간다.
새벽은 자기 시간대, 자기 기후로 세상을 덧칠하는, 석화된 숲과 잠자는 미녀들의 세상이다. 얼어붙은 이슬로 단단해진 마른 잎은 유령의 손이 되고, 사슴은 숲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돌아다니며 먹이가 녹기를 기다린다. 우리 삶의 거대한 괄호의 일부인 새벽은 삶과 물질세계의 깊숙한 회랑이 손짓할 때 살아서 죽음에 저항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른다. 그러고 나서,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켠 것처럼, 자연이 또렷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자신의 모습, 유령 같은 손, 지나온 세월의 고운 앙금까지도.

-
새벽의 인문학다이앤 애커먼 저/홍한별 역 | 반비
『새벽의 인문학』은 새벽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 느끼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책이다.
[추천 기사]
- 은퇴 준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살아남은 것은 이유가 있다
- 남다른 질문, 빛나는 대답
- 세상을 움직이는 마케터들의 한 마디

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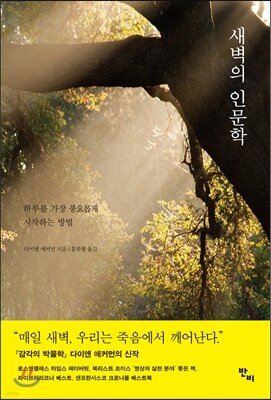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차현준 "글을 종이 위에 맘껏 저지르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40661ad8.jpg)
![[젊은 작가 특집] 이희주 "소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언어를 다뤄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11409923.jpg)
![[젊은 작가 특집] 김홍 “언젠가 청자에 대해 써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cfc5a28.png)
![[젊은 작가 특집] 김지연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b0f5351.png)
![[큐레이션] 봄이 이끄는 방향으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1-144c5c78.jpg)



별따라
2015.02.27
새벽인문학에 관심이 가네요.
앙ㅋ
2015.02.25
rkem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