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빌]사진자료_02.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7/a/9/b7a9745ec1662c1741d27865c5b54645.jpg)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에 순간에 놓이게 된다. 한 순간의 선택은 상상 그 이상의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인생은 Birth(B)와 Death(D)사이의 Choice(C)다." 라는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굴레 안에서 흘러가고 머물고 있다.
뮤지컬 <더 데빌>은 바로 그 운명의 한 가운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통해 선택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이성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인간의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 데빌>의 주인공 존 파우스트는 월가의 전도유망한 주식 브로커였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뼈아픈 실패를 맞게 되고,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검은 유혹과 마주한다. 연인 그레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은 유혹을 선택한 파우스트는 성공가도를 달리며 승승장구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영혼은 파멸을 향해 간다.
![[더데빌]사진자료_03.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e/9/4/de94dca1c737380bbe738a871d27d16a.jpg)
<더 데빌>은 인간의 탐욕, 쾌락 등 악을 엑스 블랙이라는 인물로, 인간의 이성, 의지 등 선을 엑스 화이트는 인물로 형상화 했다. 존 파우스트가 두 감정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할 때마다 두 인물들 역시 그의 옆을 맴돌며 자신을 선택 할 것을 갈구한다.
한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 <더 데빌>은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다. 무대 중앙에 x자로 교차되어 있는 계단은 네 명의 주인공이 대립하고, 그 중 누군가가 존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조명 역시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든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조명들은 각 인물들의 심리를 대변하며 극의 주제나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더 데빌>의 주인공 존 파우스트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물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달콤한 쾌락과 성공이라는 유혹의 손길을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어떤 관객들에게도 가장 진실되게 와 닿을 수 있다. 허나 <더 데빌>의 서사구조는 지극히 단순 명료하다. 좀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이야기의 부재와,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장된 연출은 조금은 어지러운 불협화음을 보인다. 평범한 인물이 한 순간 유혹을 선택하게 되고 짧은 쾌락을 맛보지만, 결국 주변사람도 자기 자신도 잃고 다시 이성을 택하게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인가 더 깊은 깨달음을 찾을 수 없음이 아쉽게 다가온다. 이야기를 최소화 한 <더 데빌>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 속에서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미지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작품의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이지나 연출의 의도는, 초연 당시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듯하다. 배우들의 뛰어난 가창력 역시 극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화려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 다는 느낌이 아쉬울 뿐이다.
2년 만에 찾아온 화제작 <더 데빌>은 4월 30일까지 대학로 드림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임수빈
현실과 몽상 그 중간즈음

기획사 제공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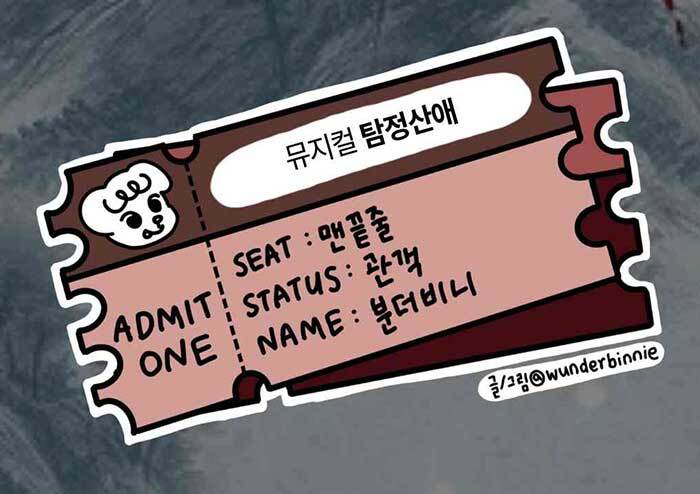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큐레이션] 끝낼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린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0-ae5312db.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울퉁불퉁 과자세트 같은 단편만화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8-49b98b6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