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붕괴하던 미싱공장 안에서 일하던 어린 여공들이 잠긴 문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법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노동 잔혹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십 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도 대접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는 미래가 지금 여기다.
박점규가 쓰고 노순택이 찍은 우리 시대 노동의 풍경, 『연장전』은 노동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노동자들 손에 들린 연장을 보여줌으로써 이상적인 노동과 현실의 그것 간 괴리를 드러낸다. 콧노래조차 금지 당한 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일하는 대학교 미화원 아주머니의 존재를 꺼내놓는다.
 |
 |
1985년 구로동맹파업 당시 사무장이었던 강명자 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당시를 회상하며 말한다. "단 한 번도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한 적 없는 대통령이 우리 딸과 아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사계’의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라는 멜로디가 몇 번씩이고 머리 속에 감긴다. 물론 이런 거 몰라도, 신경 안 써도 누구네 인생은 잘도 돌아간다. 굳이 괴로운 이야기를 꺼내 읽지 않아도 인생은 이미 힘들다. 알고 더 힘들게 살고 싶은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노동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있어본 적이 거의 없다. 노동의 변두리에서 오해 받으며 어제보다 어려운 오늘을 맞기 일쑤였다. 미싱은 잘도 돈다는 지난 문장을 다시 곱씹는다. 정말 그런가? 노동은 교육 문제와도 이어진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노동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사회로 내몰고 있다. 노동을 향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노동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자주 불편해야 하는 이유다.
‘문턱을 낮춘 인문학’의 본질이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을 ‘고민’하는 일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쏟아져 나오는 인문학 입문서 속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 한 권을 골라 드는 일이 조금 더 나은 삶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연장전』은 그러한 책 중 한 권이다.
연장전
출판사 | 한겨레출판

송재은(도서MD)
활발한데 차분하고, 열정적이고 시큰둥하며, 이기적이며 연민하는 애매한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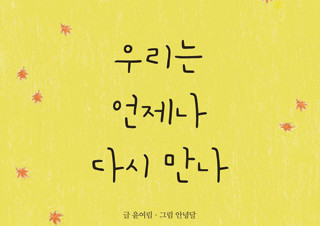



![[김이삭 칼럼] 문자와 문자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희곡 번역](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9-d9cb953b.jpg)
![[에디터의 장바구니]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부터 『절대 진공 & 상상된 위대함』까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2-0311a97d.jpg)

![[여성의 날] 논바이너리의 여성적 기원 - 그녀와 그를 지나 당신(they)으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4-488cc3d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