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원되기 전, 이한열 열사의 타이거 운동화. ⓒ (사)이한열기념사업회
* 영화 <1987>(2017)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홍대입구 근처에 살던 시절, 산책을 할 때면 나는 경의선 옛 철길 부근으로 걷곤 했다. 걷다 보면 이희호 여사가 아직도 지내고 계신 김대중 대통령 가옥도 나오고 김대중기념도서관도 있고 이한열기념관도 있었다. 산책의 어느 날 무심코 끌리듯 들어간 그 기념관은 작고 소박했다. 그 시절의 20대 초반 청년이 흔히 입고 쓰고 보았을 법한 일상적인 물건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대부분의 위인이 쓰던 유품이 그렇듯, 지극히 일상적인 소품들은 그 주인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 영원의 가치를 얻는다. 그가 열사의 칭호 대신 나처럼 적당히 타협도 하며 30대에 진입하는 삶을 얻었더라면, 물건의 수명이 다 하는 대로 진작에 폐기되고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었을 법한 물건들. 나는 열사가 신었던 타이거 운동화 앞에서 잠시 서성였다. 그 유명한 타이거 운동화는, 아직 복원되기 전이었던 터라 쥐면 바스라질 것처럼 훼손된 상태로 전시 중이었다.
영화 <1987>에서 타이거 운동화는 로맨스의 매개물로 그려진다. 강동원이 연기한 이한열 열사는 명동 미도파 앞 시위에 휘말려 백골단에게 끌려가던 연희(김태리)를 도와 도망가다가 신발 한 짝을 잃는다. (그가 이한열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극장을 찾은 이들은 이미 그 장면에서 한 차례 심장이 쿵 하고 내려 앉는다. 그러나 미도파는 연세대 정문이 아니고, 우리는 다가올 비극을 알면서도 그 장면을 아린 마음으로 견뎌낸다.) “에이, 안 돼. 이대로 나갔다간 바로 걸려.” 두 사람을 숨겨준 신발가게 주인(황정민)의 말에, 초면의 연희가 냉큼 제 지갑을 열어 사준 신발이 바로 문제의 타이거 운동화였다. 적잖은 사람들이 이 설정에 분노했다. 연희를 ‘고작 로맨스 때문에 운동에 결합하는 존재’로 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이한열 열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품을 그렇게 가벼운 내용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열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신화화 하려는 엄숙주의 앞에서, 나는 다시 이한열기념관에서 느꼈던 기묘한 서글픔을 마주했다. 그 시절, 스러져 간 많은 청춘들이 죽거나 다치는 걸 각오하고도 싸움에 나선 건 역설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한열 열사가, 박종철 열사가, 김경숙 열사가, 전태일 열사가, 이석규 열사가, 노수석 열사가 채 건너오지 못했던 20대를 건널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한다. 살아서 승리하고, 나이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서툴게 첫 데이트도 하며, 한참 유행하던 운동화를 선물로 주고 받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너무 낡고 헤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되면, 보존하여 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러듯 아쉬운 마음으로 버리고 새 운동화를 사는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로맨스의 매개가 된 타이거 운동화는, 열사들이 채 살지 못했던 삶, 미처 가보지 못해 가리워진 길들에 영화가 보낸 위로가 아니었을까.

이승한(TV 칼럼니스트)
TV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한때 '땡땡'이란 이름으로 <채널예스>에서 첫 칼럼인 '땡땡의 요주의 인물'을 연재했고, <텐아시아>와 <한겨레>, <시사인> 등에 글을 썼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좋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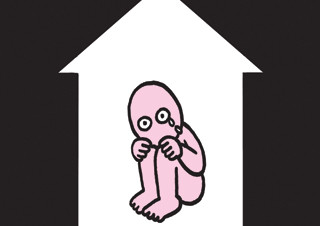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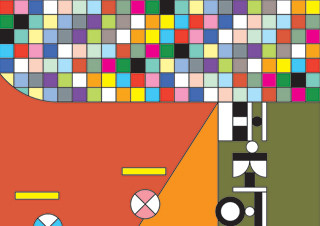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구구X리타] 야쿠자의 심장을 가진 여자 - 존엄을 위해 싸우는 마음에 대하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7-ab0fd518.png)
![[리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2-b3fd5867.png)
![[큐레이션] 삶과 연결될 때 앎은 흥미롭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55ef89b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