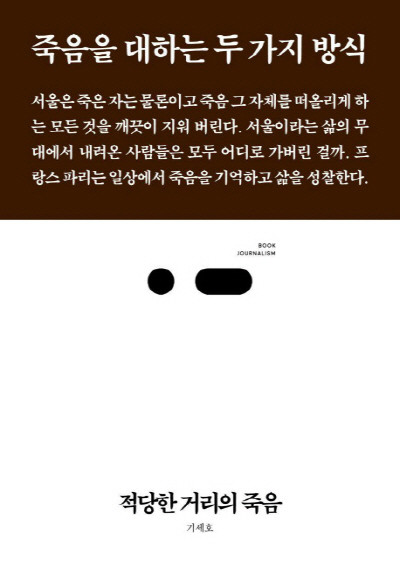
인간에게 가장 필연적인 미래는 죽음이 아닐까. 어둠이 빛의 그리듯, 생과 사는 서로의 바탕이 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과 죽음을 고민하게 되고 순간의 파편들이 엮여 다채로운 색상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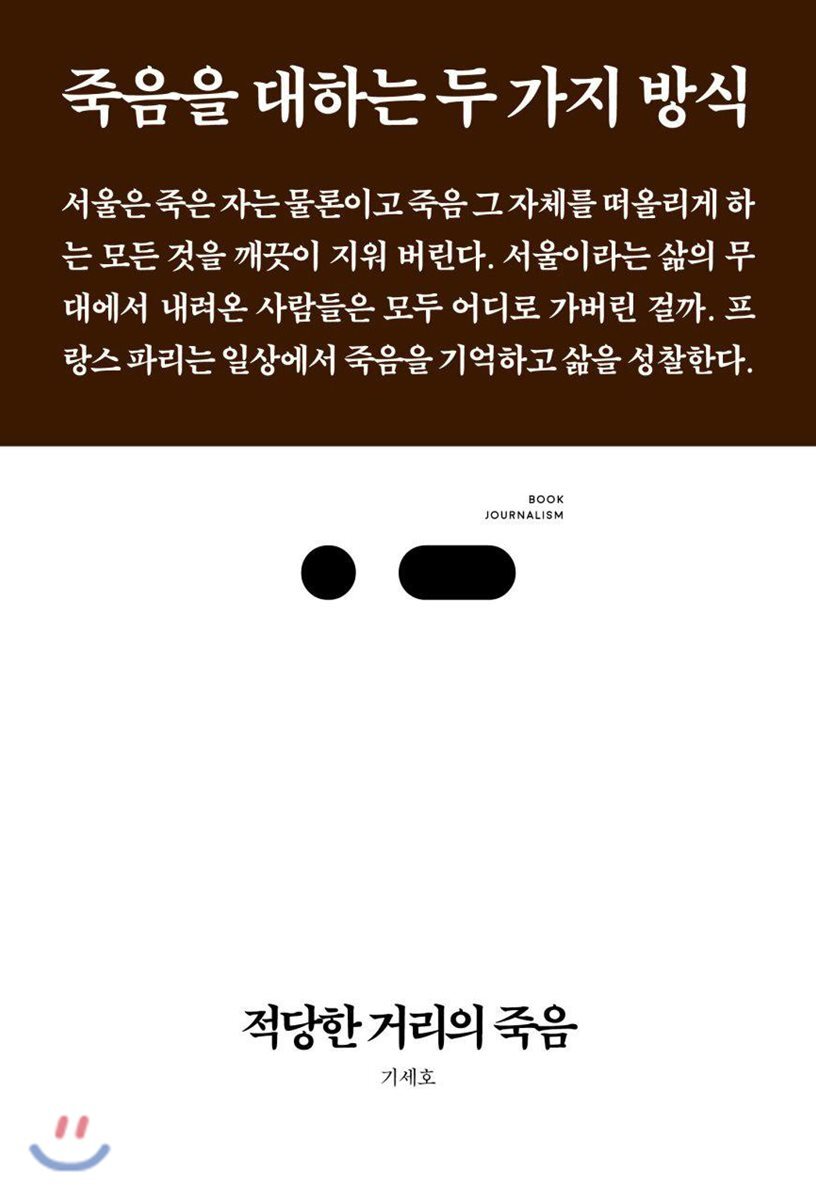 |
 |
건축을 다루는 저자는 죽음과 삶의 공간으로 대표되는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서울과 파리를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 무덤의 공간적 의미와 죽음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는 주로 도시의 성장을 따라 죽음과 삶의 관계 변화를 짚어간다. 과거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더불어 살았다. 무덤이 삶의 터전과 공존하여 사람들은 망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공간에서 삶을 이어나갔다. 망자들은 언제나 현실에 영향을 미쳐왔다. 다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묘지를 위한 공간은 부족해졌고 죽음은 계속해서 도시 밖으로 몰려나게 되었다.
현대 도시는 전문적으로 구획을 나누어 단편적 역할에만 충실하고, 공간에 대한 경험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파편화 되었다. 저자는 철도와 기차의 발명이 세계를 산산조각 낸 다음, 다시 직선으로 이어 붙인다고 지적한다. 죽음의 공간, 묘지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공간의 긴밀한 관계가 상실될 때에 죽음도 일상에서 멀어지며 삶과 점차 분리된다. 삶에서 죽음을 배척하는 태도는 망자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존재가 아니다. 공간에 켜켜이 쌓여온 시간과 개인의 경험, 감정이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삶은 작동한다. 한번쯤은 곁에 머물렀던 수많은 죽음을 되새겨보길 권한다. 그들의 사랑과 의지가 나의 삶에 어떤 감동을 주는지 고민할 때 우리는 죽음과 적당한 거리를 가질 수 있다.
-
적당한 거리의 죽음기세호 저 | 스리체어스(threechairs)
화려함과 생기로 가득 찬 서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파리의 묘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 바로 삶에 대한 성찰일지도 모른다.

송재은(도서MD)
활발한데 차분하고, 열정적이고 시큰둥하며, 이기적이며 연민하는 애매한 인간.









![[최현우 칼럼] 우리는 좌초되지 않는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ff34b9b7.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송섬별 칼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04-2468aa04.png)
![[여성의 날] 우리는 유령국가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6-722027e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