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열광금지, 에바로드』 를 내고 나서 한동안 이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 책 얼마나 팔렸나요? 2쇄 찍었나요?” 여러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그걸 궁금해 했다. 그때 나는 등단 뒤 두 번째 장편소설을 낸 신인 작가였다. 한국문학 출판사들이 나를 두고 쟤는 어떤 앤가, 책을 내자고 해볼까, 간을 보던 시기였던 것 같다.
두께나 장정, 인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범한 단행본은 3000~6000부 정도 팔리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고 한다. 별 근거 없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소설가의 경우 대략 판매량이 5000부 언저리일 때 ‘문단의 주목을 받는 작가’에서 ‘한국 문학의 기대주’ 정도로 호칭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러다 1만 부가 팔리면 ‘한국 소설의 미래’ 소리를 듣고 3만 부쯤 팔리면 베스트셀러 작가, ‘대세 작가’가 된다. 판매량 10만 부 즈음에 또 상전이(相轉移)하는 구간이 있는 듯하다.
단행본 한 권 가격이 요즘 1만5000원 안팎이다. 책이 한 권 팔릴 때 저자가 받는 돈, 즉 인세는 대부분 책값의 10%다. 그러니 한국 문학의 기대주는 인세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고, 한국 소설의 미래도 인세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계산기 두들기며 겨우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겠다. 대세 작가라도 집 사고 싶으면 강연과 방송에 열심히 나가야 하고.
유명한 냉면집이나 콩국수가게는 여름이면 냉면과 콩국수를 단 하루에도 수천 그릇씩 판매한다는데, 참으로 민망하긴 하다. 그 가게들은 냉면 토크, 콩국수 콘서트 같은 행사도 안 여는데. 이게 출판계 현실이고 한국 문학 현주소다. 한국 문학의 기대주가 평론가와 언론의 호평을 얻고 출판사와 서점의 마케팅 도움을 받고 정부 지원사업과 면세 혜택에 힘입어 대한민국 전체에서 책을 팔아도, 근처 주민 상대로 조용히 장사하는 동네 맛집의 순댓국이나 파스타보다 안 팔린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변명을 하자면, 신인 작가들이 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요즘 젊은 미국 작가들의 에세이와 인터뷰를 엮은 『밥벌이로써의 글쓰기』 에는 한국 못지않게 착잡한 사연들이 많이 나온다.)
이야기를 다시 앞으로 돌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다음 책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작가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1만, 2만 부가 팔리는 작가는 자기 인세로는 외식 즐기기도 빠듯한 주제에 출판계에서는 벌써 인기인이다. 출간 계약은 이미 여러 건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원고를 금방 받을 수 있는 다음 기대주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눈에 띄는 신인에게 “지난번 책 얼마나 팔렸나요? 2쇄 찍었나요?” 하고 묻게 된다. (여기서 팁 한 가지. 신인이고 2쇄를 찍었다면 주변에 자랑하고 소문을 내라. 그래야 다음 책을 낼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작가들이 잘 모른다. 우선 출판사마다 인세를 입금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어떤 회사는 아무 통보나 설명 없이 불쑥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 3쇄를 찍게 됐을 때 2쇄 인세를, 4쇄를 찍을 때 3쇄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금액을 단행본 가격으로 나누고 10을 곱해서 해당 쇄를 얼마나 찍었는지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그 출판사에서 책을 두 종 이상 냈을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책에 대한 인세인지 알 수가 없다. 담당자가 직접 저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그 회사 규칙일 텐데, 일이 많아 바쁜 듯하다. 액수도 크지 않은데 나도 일일이 물어보기 귀찮다. 그냥 뭔가 들어왔나 보네, 하고 만다. 그런 기간이 쌓이면 어떤 책이 몇 쇄를 찍었는지, 얼마나 팔렸는지 감도 못 잡게 된다.
언제 몇 쇄를 찍었느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별로 출고한 부수에 따라 인세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쪽이 좀 더 관리하기 편하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어떤 출판사는 그런 보고서를 매달 보내주고, 어떤 곳은 석 달마다, 어떤 곳은 반년에 한 번씩 보내온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거기에 기간별 출고량이 아닌 누적 판매부수는 적혀 있지 않다. 종이책과 전자책 판매내역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내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냥 뭔가 들어왔나 보네, 하고 만다.
어떤 책을 여태까지 몇 부나 찍었는지 그 합계를 내게 정기적으로 알려오는 출판사는 딱 한 곳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걸 이메일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온다. 도장을 찍어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작가가 원하는 때 자기 책 누적 판매량을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말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다들 ERP 시스템을 사용할 텐데.
출판사에서 아무런 보고서도 안 보내오고, 아무 돈도 안 들어오는 책도 있다. 문학공모전 수상작 몇 편이 그렇다. 상금이 선인세라서, 몇만 부가 팔리기 전에는 내게 인세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러니 인세보고서도 보내지 않는 것 같다. 이들 책이 몇 부 팔렸느냐고 누군가 물어오면 그냥 대충 대답한다.
출판사가 아니라 서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있을까? 영화라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객 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영화관에서 발권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계에는 이런 통계가 없고, 책 판매량을 밝히는 서점도 거의 없다.
주요 인터넷 서점들은 대신 판매지수라는 숫자를 공개한다. 출판계 종사자들 중에는 이 지수를 통해서 해당 서점, 혹은 전체 시장에서의 책 판매량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그런 ‘공식’을 두 가지 들어봤는데, 내 책에 적용해 보면 둘 다 들어맞는 것 같지 않다. 그나마 신간에만 적용되는 방법들이라, 그 공식으로도 누적 판매량을 알 수는 없다고 한다.
이 글을 읽은 편집자들은 내게 아무 때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판매량을 물어보라고 할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다. 작가뿐 아니라 출판사도 책 판매량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 사실 한국에서 어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다음 회에…….
-
밥벌이로써의 글쓰기록산 게이, 셰릴 스트레이드, 닉 혼비 저/만줄라 마틴 편/정미화 역 | 북라이프
본업을 그만두는 것은 공상이고 글 쓰는 삶 이외의 일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작가, 예술가가 본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하는 작가도 있다.

장강명(소설가)
기자 출신 소설가. 『한국이 싫어서』,『산 자들』, 『책 한번 써봅시다』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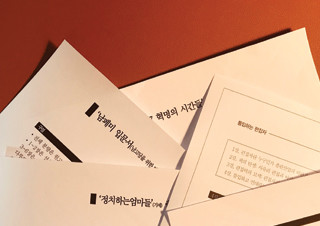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김지연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b0f5351.png)
![[젊은 작가 특집] 김기태 “첫 습작은 ‘상상의 여행기’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9e2e49b6.png)
![[젊은 작가 특집] 고선경 “인공지능과 연애하는 인물을 그려 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c4941e46.png)






앵날
2020.05.08
iqueenia
2019.11.15
윤초록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