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명의 붉은 실. 실을 쓸지 말지도 내마음이지.
운명의 붉은 실. 실을 쓸지 말지도 내마음이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으로 갈 수 있다면 언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과거로만 갈 수 있고, 당신이 그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다시 보았다. 워킹타이틀 제작,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 시간 여행 등, 관련 단어들을 나열했을 때 떠오르는 분위기, 거기에서 로맨스를 몇 숟가락 덜어낸 느낌. 나에게 이 영화가, 때 되면 꺼내볼 작품이 된 이유는 그거다. ‘어바웃 러브’라기보다는 ‘어바웃 라이프’, 영화가 향하는 것이 결국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로맨스도 사는 이야기이긴 한데, 로맨스와 코미디, 드라마 사이에서 이 영화가 맞춰가는 균형감이 좋다. 아무튼 이것은 ‘어바웃 타임’. 핵심 소재는 시간, 시간 여행이다.
시간을 여행하는 것은 가능한가.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려운 문제지만 말이야 안될 것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2020 원더키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직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원더키디의 날이 진짜 오다니!) 언젠가 반드시 빛보다 빠르게 달려 상상을 뛰어넘어 보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 책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야기는 늘 불가사의한 것이니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일이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것일 뿐. 틀에 박힌 이것저것을 차치하면, 아직은 가상이라 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시공에 균열이 일 만큼 강한 에너지의 무언가가 발생하고,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모이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세계는 타임루프에 들거나 하나 둘 평행우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다만 언제 어떻게 어느 시대에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역사 공부를 해두자. 뭘 알고 가긴 해야겠더라.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책이 시간 여행을 다룬다. 시간 여행의 무엇이 우리를 매혹하는 걸까. 왜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까. 어쩌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판타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자연히 따라오는 미스터리는 덤이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딱 그만큼 씩 계속 앞으로만 가서는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무엇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 뒤에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것 말이다. 새벽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찬 우유를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다음 날 거의 기다시피 병원에 가서 장염 진단을 받았다.)와 같은 소소하지만 확실히 지우고 싶은 순간들부터, 마음 속으로만 자꾸 곱씹게 되는,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두 번 세 번 백 번 말해줄 걸 아낄 게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까지. 자발적으로든 떠밀려서든,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가든 마지못해 겨우 한발씩 내딛든, 별일없이 사는 한 우리는 웬만해서는 앞으로 앞으로 갈 뿐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 현실은? 정말 바꿀 수는 없을까. 살고 죽는 문제는 말고. 뭔가를 뿌리째 움직여버린 그런 것도 말고. 다른 것들. 흔적은 남겠지만 어떤 과거는 지금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기억은 불확실한 것이고 하나의 사건은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수 가지로 각색되어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내 오늘의 선택이 과거 어느 순간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역사적 진실이야 어떻든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보는 과거라면 가능하지 않나.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가 ‘다시는 안 볼 놈’을 ‘당장은 안 볼 놈’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내가 바꿀 수 있다. 내 선택이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진실에 대한 느낌이나 주장은 감각과 상상력에 동일하게 의존한다. 헬렌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뇌에 직접 전달하거나 기록할 방법은 없으며, 고도의 주관적 방법으로 여과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마다 여과 및 재구성 방법이 다르고,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나중에 회상할 때마다 재여과되고 재해석되기 일쑤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서사적 진실밖에 없고, 우리가 타인이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재범주화되고 다듬어진다. 기억의 본질 속에는 이러한 주관성이 내장되어 있으며, 주관성이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뇌의 토대와 메커니즘에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착오는 비교적 드물고,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굳건하고 신뢰할 만하다니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올리버 색스, 『의식의 강』 133-134쪽
나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이 삶을 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선택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여선, 『레몬』 35쪽
지금 인생의 어느 한 순간으로 갈 수 있다면 4학년 2학기, 11살의 겨울이 좋겠다. 얼마 전 다시 본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 부분에 선생님은 이런 의견을 남겼다. ‘리코더 연주를 남달리 잘 합니다.’ 이 한 줄에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혹시 설마 리코더 연주로 무언가를 이루었을까. 돌아갈 수 있든 없든, 아무튼 라이프, 리코더를 사 볼까. 리코더 하나로 나의 지난 기억을, 남은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
추천기사

박형욱(도서 PD)
책을 읽고 고르고 사고 팝니다. 아직은 ‘역시’ 보다는 ‘정말?’을 많이 듣고 싶은데 이번 생에는 글렀습니다. 그것대로의 좋은 점을 찾으며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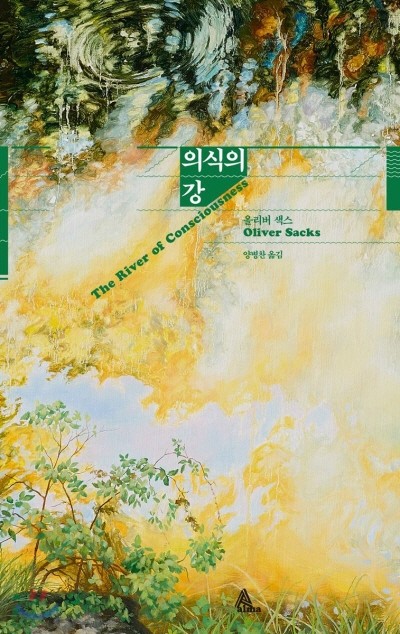






![[인터뷰] 이다, 관찰하는 순회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0-788ba31a.jpg)
![[구구X리타] 영원이라는 불가능에 도달하기 – 내가 글을 쓰는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8-27b9652d.jpg)
![[리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8-1a283524.jp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김지승 칼럼] 당신, 있습니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1/7/9/7/1797844467653b524bf193d4fb5f19b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