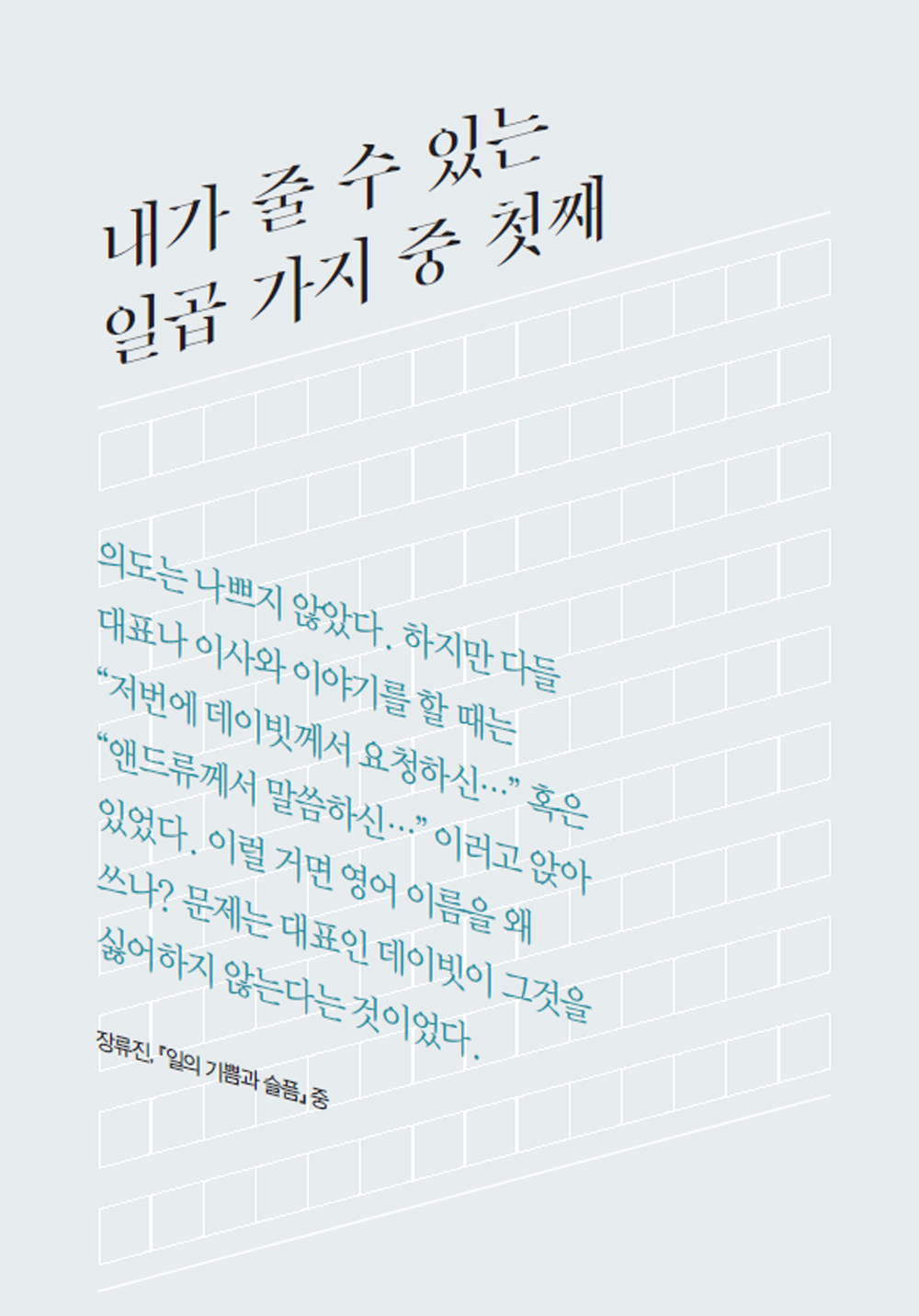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다들 대표나 이사와 이야기를 할 때는 “저번에 데이빗께서 요청하신......” 혹은 “앤드류께서 말씀하신......” 이러고 앉아 있었다. 이럴 거면 영어 이름을 왜 쓰나? 문제는 대표인 데이빗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중
‘너 몇 살이야?’는 한국인들 논쟁의 슬픈 종착역이다. 사실의 맥락이나 의견의 디테일은 이내 실종되고 상대의 태도에 깃들인 사소한 무례함이 돌연 중대 현안이 되어 버린다. 나라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적 이견에서 비롯된 정치인들의 논쟁이건 길거리 사소한 주차 시비건 간에 너 몇 살이냐는 이 느닷없는 비약을 웬만해선 피해갈 수 없다. 서로의 이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의 랠리를 이어갈 줄 아는 토론이 드문 데에는 우리말이 가진 특성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지금 생각하면 비교적 초창기에 트위터에 가입했다. 그곳에선 내가 카피라이터 이원흥인 줄 아무도 몰랐다. “명료하면서도 모호하길 원했지만, 명료하거나 모호하기만 합니다.” 이 모호한 한 줄이 트위터라는 신세계에서 내가 나를 설명하는 전부였다. 애초에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 사람인지 아닌지, 회사원인지 학생인지 모르는 채로 말을 걸고 어떤 얘기에 공감하고 취향을 공유하고, 몰랐던 걸 깨닫거나 배웠다. 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신선하고 놀라운 일종의 첫 경험이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채 오직 생각과 말을 보고서 멘션하거나 팔로우하는 관계 맺기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우리말로 하는 대화란 서로의 상하관계가 양쪽 다 수긍할 만하도록 사전에 묵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한 마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십년 만에 우연히 만난 지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막상 반가움은 1초, 예전에 반말하는 사이였는지 존대하는 사이였는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과부하가 걸리는 경험이 그래서 익숙하다.
세분화된 존대법을 가진 우리말이 그런 문화를 만든 것일까, 아니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그런 말을 낳은 것일까. 아버지께 용돈을 받으려는 시도가 ‘당신이 말이죠...’라고 시작된다면 보나마나 끝장 아니겠나. 나이 든 택시 기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무 살 청년이 호칭에서 삐끗하면 너 몇 살이야, 로 직행하는 건 시간문제다. 말하자면 서로를 뭐라 부를지 호칭이 적절하게 결정되지 않고선 우리말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아주 많이 탈바꿈한 게 사실이다. 여러 기업들이 눈에 띄게 수평적 조직 문화 만들기에 앞장섰고 그 중 어떤 것들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리 차장 같은 직급을 없애고 매니저나 프로 같은 호칭을 도입하거나, 사장과 신입을 막론하고 서로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 같은 것 말이다. 회사는 그 문화가 경쟁력과 연결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좋은 인재를 끌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치명적일 수밖에! 하지만 우리는 회사에서만 살지는 않는다. 회사 밖에 남아있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는 몸과 마음에 DNA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일할 때 새롭게 도입된 수평적 호칭이라든가 직급 체계와 우스꽝스럽게 충돌하기도 한다.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은 이런 공감대를 리얼하게 묘파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도 카피라이팅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면 조만간 잘 안 될 때가 올 것이란 말이고, 지금이 잘 안 풀리는 시절이라면 언젠가 잘 될 때도 분명 올 것이란 의미기도 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관계를 넓혔을 때 일이 잘 됐고, 반대로 관계가 좁아졌을 때 일은 왠지 잘 풀리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더 믿고 더 의논하고 더 존중할 때 나는 그에게 더 눈 맞추며 가벼운 인사를 먼저 건넸고 그러다 사는 얘기 일 얘기로 공감대를 넓혔다.
함께 일하는 시너지가 상승효과를 제대로 낼 경우란 딱딱한 회의실이 아니라, 사소한 스몰토크에서 틔운 불씨를 신나게 발전시켜 나아간 결과일 때가 많다. 아침에 얼굴 보며 ‘좋은 아침이야!’ 인사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계속 바쁘시던데 점심은 드셨어요?’ 물으며 눈을 보자. ‘주말에 날씨 참 좋던데 뭐 했어요?’ 커피머신 앞에서 종이컵 노려보지만 말고, 인사하자. 인사는 드리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인사는 내가 잘 안될 때 내 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동료에 대한 리스펙트이며, 우리가 서로 도모해서 한번 잘해보자는 파이팅 같은 것이다. 말에는 마법의 힘이 있다. 내가 먼저 밝은 기분을 한껏 끌어 담아, 가벼운 인사를 입 밖에 낼수록 무엇보다 내가 먼저 밝아진다. 밝게 건넨 나의 인사는 덤덤했던 동료의 분위기까지 순간 쨍쨍하게 밝혀준다. 무슨 일이든 밝고 선선한 마음으로 최선의 파이팅을 다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잘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인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인사는 정치가 아니다. 아부나 아첨은 더더욱 아니다. 상사에 대한 고루한 예의의 강요가 아니라,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몰토크다. 모니터의 커서만 째려보지 말고 동료에게 ‘오늘 스트라이프 양말 멋진데!’ 먼저 인사하는, 복도에서 마주친 기획팀장에게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잘 어울려요!’ 웃으며 인사하는, 횡단보도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며 대표에게 ‘어제 저녁 노을이 정말 끝내주던데 보셨어요?’ 환하게 인사하는 카피라이터가 관계와 평판이 더 좋아지고 호감도와 신뢰가 높아지며 결국 일을 더 잘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께 물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잘 나가는 게 당연하고 잘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믿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알 만한 사람이긴 하다. 저 한심한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전해오는 지혜로운 말씀은 이러하다. “그것은 네가 베풀지 않아서다.” 교만한 질문자가 알아들을 리 없다.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남에게 베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빈털터리라 해도 누구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말씀해주시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온화한 낯빛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 자체가 베풂이라는 것. 나는 그게 인사라고 생각한다.
실은 내가 그래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담배나 한 대 피울까? 라는 인사를 건네며 나는 나 혼자서는 미련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지점을, 내가 믿는 내 동료와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것이다.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도 물론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좋겠지만.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원흥(작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를 쓴 카피라이터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순진김밥 이야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f/d/d/5fdd321a33c3f1cc518c8d5f2a89314d.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어른의 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a/8/1/7a8114ff15e2fbc36f94dc094b6dbc7b.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내 곁의 거인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3/7/3/537374e5b93cce2b8235a70b5d255e0e.jpg)

![[이옥토 X 이훤] 보고 있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면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4-207bb1de.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몸과 몸뚱이와 몸짓](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5-17ec346e.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큐레이션] 요리책도 책이다, 실용적이고 재밌는 레시피북 추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f/d/9/8/fd9893cf8ced7e5d5043247ca6e3021b.png)





evewhite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