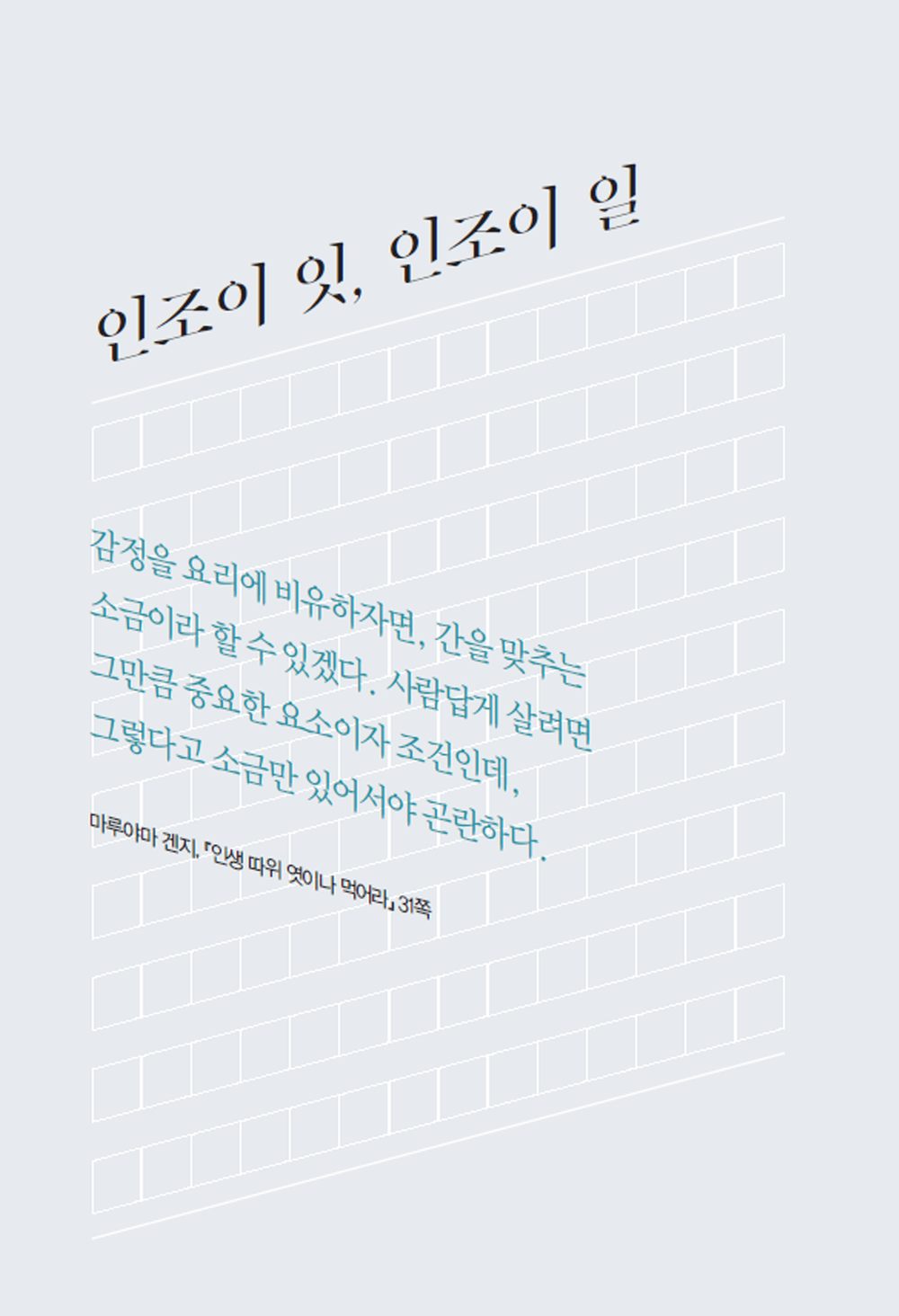
감정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간을 맞추는 소금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답게 살려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자 조건인데, 그렇다고 소금만 있어서야 곤란하다.
_마루야마 겐지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31쪽
인간만이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도 웃고 개들도 소리 내서 웃고 놀랍게도 실험실의 쥐들도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웃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함께 웃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지 않을까? “지구라는 행성에는 무리 짓기 좋아하는 영장류 동물이 있다. 이들은 떼 지어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거의 기절할 때까지 함께 헐떡인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 상자를 바라보며 가상의 무리를 짓고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다함께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인간의 웃음에 대한 칼 세이건의 농담이다. 그의 말 속 동굴은 영화관이고 상자는 TV다. 우리는 그렇게 극장에서 웃고 예능을 보면서도 웃지만, 사실 누구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가장 많이 웃고 싶을 거다. 바로 내가 일하는 곳, 직장에서다.
그래서 회식을 하기도 한다. 회식 자리에서 회사 얘기 일 얘기는 이심전심으로 금기다. 골치 아프고 재미없으니까. 함께 웃고 싶으니까. 가볍게 재밌는 얘기를 찾아 공통의 화제로 올리는 것이 즐거운 회식 자리를 만드는 센스가 된다. 까르르 깔깔깔 함께 웃는 웃음에 술과 밤이 만드는 분위기가 더해지면 친밀감의 게이지는 최고치에 다다른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친밀감이 정작 다음날 회의실에서 온데간데없는 경우가 생긴다. 허탈함이 몰려오고 야릇한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왜 그런 걸까?
어깨동무하고 함께 웃으며 즐겁게 술 마신다고 해서 일이 착착 잘 되는 건 아니다. 관계가 일의 일부분일 수야 있겠지만 본질일 수는 없으니 말이다. 즐거운 분위기나 함께 웃는 건 마루야마 겐지 식 표현으로 하면 소금 같은 것이겠다. 사람답게 살려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자 조건인데, 그렇다고 소금만 있어서야 곤란하다.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을 즐긴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최근 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졌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머리 속에 떠오른 첫 번째 키워드는 ‘필패의 링’이었다. 우리는 회의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과 그 판단이 근거하는 사실들을 고통스럽게 공유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면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질 게 뻔한 데 기운 뺄 거 뭐 있나, 체면치레 정도만 하자? 그냥 슬슬 회의실에서 즐겁게 농담이나 하다가 아이디어 몇 개 정리해서 연습 삼아 주니어에게 프레젠터 기회를? 그러면, 진짜 지는 거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옳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강력한 설득력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자! 그게 지더라도 멋지게 지는 길이고, 그렇게 멋지게 져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만 다른 일에 이길 수 있다. 계획대로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했고, 계산대로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은 강력했으며, 예상대로 우리는 졌다. 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을 즐기고 있다고 느꼈고, 일을 즐긴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냥 깔깔깔 호호호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말이다. 그것이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지루하며 때론 허탈할 지라도.
아마추어는 좋아하기만 해도 된다. 프로는 좋아하기만 해선 안 된다. 내 취미가 광고라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도 된다. 내 직업이 광고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공부하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질투하고 시도하고 예측하고 환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싸워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정진하는 것이 진정 그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광고든 뭐든 간에 한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그 일을 즐긴다는 것이 결코 하하호호만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 탄 남자에 관한 옛날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를 보고 길가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길래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요?” 말 탄 남자가 대답했다. “저야 모르죠. 그야 말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가끔 이 우습고 어리석은 남자 이야기를 떠올릴 때가 있다. 아이디어나 기획 방향 회의를 하는데 왜 그 회의를 하는지, 결국 무슨 목표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지 모른다면 과연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나의 고양이 물루가 무지개다리를 건너 고양이 별로 떠났다. 아침이면 언제나 식탁 위로 뛰어올라 그 파란 눈동자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식의 파트너, 책읽기와 글쓰기의 사랑스런 훼방꾼을 잃고 나는 고통스러웠다. 도스토옙스키의 딸 쏘냐가 죽었을 때 그의 지인들이 그런 딸을 또 낳으면 되지 않냐고 위로하자 저 위대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파란 눈의 쏘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내가 위대한 작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내 지인들이 위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루 같은 고양이가 셋이나 더 있지 않냐는 말로 나를 위로하려드는 사람은 없었다. 그 파란 눈의 물루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슬픈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나의 지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못 데려온다고. 위로라는 걸 잘 알면서도 나는 생각했다. 고통이 있을 거란 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야말로 일과 삶의 정언명령이 아닐까. 사랑 이후에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랑을 찾아서 나는 더 잘 사랑하고 싶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클레멘타인이 말한다. “이 기억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거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 질문에 대한 조엘의 대답을 나는 잊지 못한다. “인조이 잇!” 사랑에 마땅한 태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고 집중하고 음미하는 게 아닐까. 일에 대한 사랑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딸한테 ‘예비 고3님 준비 잘 돼 가나?’ 라고 싱겁게 농담 한 마디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예비 고3이란 게 어딨어? 그럼 아빠는 예비 노인이야?”그게 볼멘 딸의 반론이었다. 예비 고3이란 게 있다면 딸의 말대로 우리는 예비 대학생을 거쳐 예비 사회 초년생을 지나 예비 중년, 예비 은퇴자, 예비 노인, 그러다 결국 예비 고인이 되고 만다. 진짜 삶은 그런 게 아닐 거다. 열일곱을 살고 스물둘을 지나 서른과 마흔의 순간에 서른으로 일하고 마흔으로 살아야 한다. 예비의 인생을 살지는 않기로 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다. 괴로워도 슬퍼도 떨리거나 무서워도. 일을 즐긴다는 건 그런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나의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에게 ‘좋은 아침!’이라 인사할 거다. 괴롭고 슬프고 떨리고 무서운 일들을 잘 해나기 위해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시작, 그 좋은 아침을 자축하는 기분으로 말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출판사 | 바다출판사

이원흥(작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를 쓴 카피라이터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대박 파이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0/c/6/60c6ae7368f947b14aa4d8cb6152ae4d.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내가 줄 수 있는 일곱 가지 중 첫째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a/9/d/aa9df13484da014795aa22c3d7489ea1.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순진김밥 이야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f/d/d/5fdd321a33c3f1cc518c8d5f2a89314d.jpg)

![[젊은 작가 특집] 설재인 “내가 쓰는 것의 백 배 정도 되는 분량을 먼저 읽을 것”](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b6c4e0bc.pn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리뷰]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환상](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0/6/1/4/0614d74fc2e7c06b87571a22c47aa75d.png)
![[큐레이션] MZ 리더를 위한 리더십 고민 해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6/2/5/f/625f3e4e29c46bbc490e1bc2c22c62e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