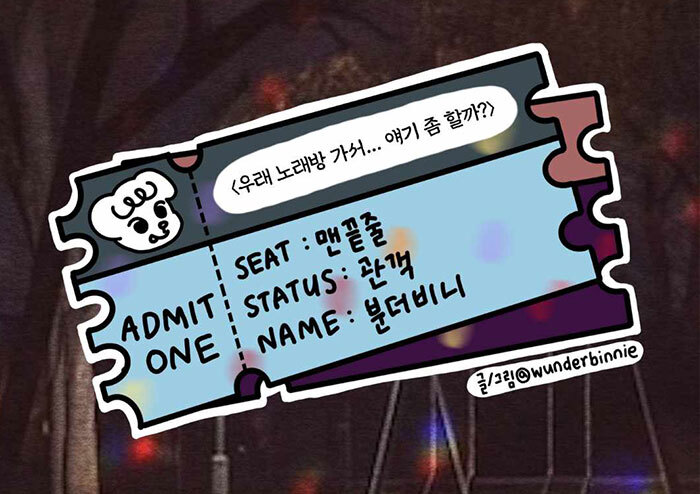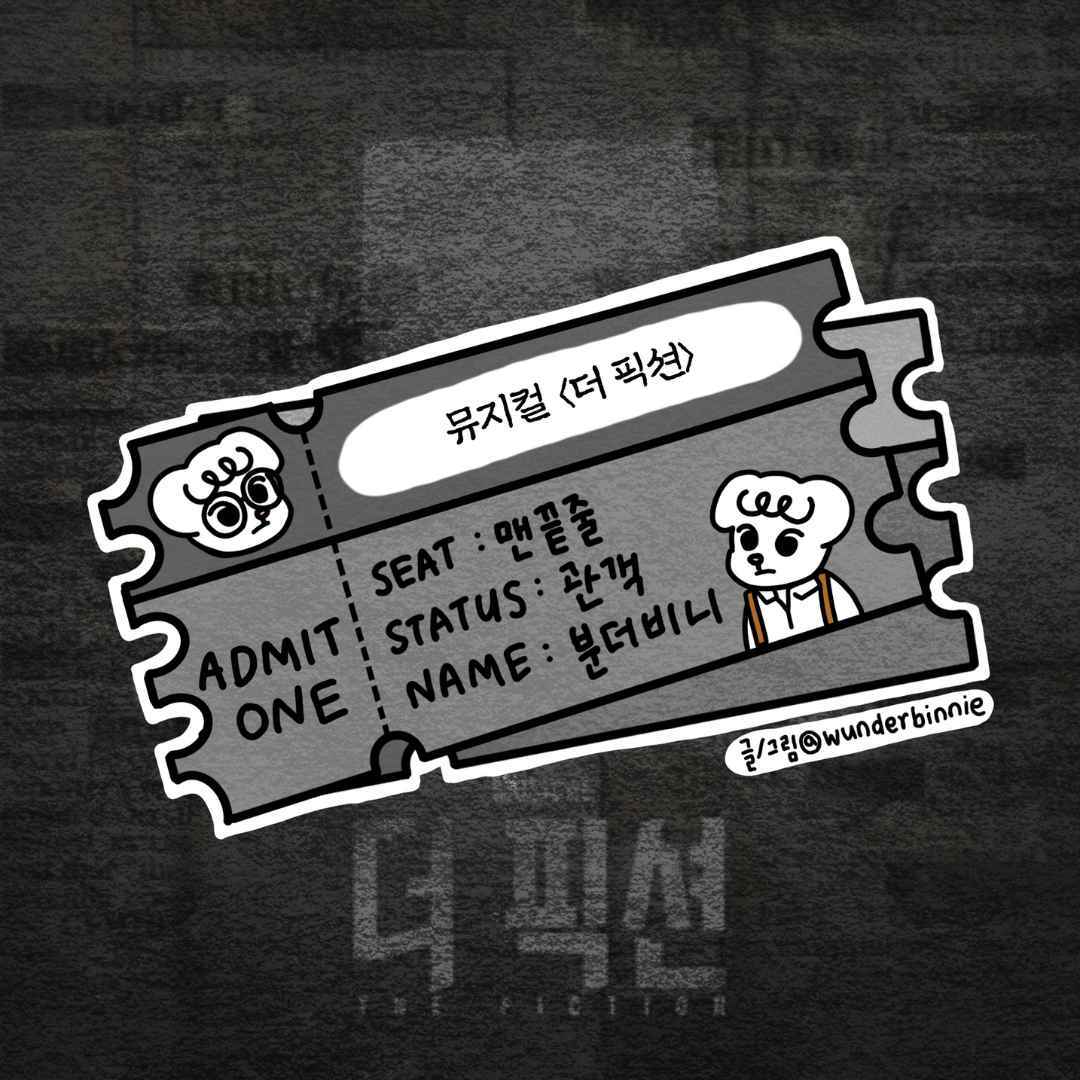소설가는 마감 때 무엇을 먹을까? 염승숙 소설가와 윤고은 소설가가 글쓰기와 음식에 관한 에세이를 번갈아 연재합니다. 매주 목요일을 기대해주세요. |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슈톨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12월의 빵집에 가면 아무래도 슈톨렌을 사게 된다. 12월의 빵집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아기자기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동화 속에서 나는 뭐든 제철 감각을 자극하는 것을 집어 들게 되는 것이다. 그게 슈톨렌일 확률은 꽤 높다.
올해는 11월 말에 슈톨렌을 샀는데 빵집 주인이 그걸 포장해주면서 1년 전부터 과일을 럼주에 담가 이 슈톨렌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했다. 내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빵은 슈톨렌이 유일한 거죠?" 이렇게 말하자 그는 "그렇죠, 그리고 25일까지 조금씩 잘라 먹으면서 기다리고오오오 그런 빵이잖아요"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고오오오"가 아주 길어서 두 사람 다 웃게 됐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잘라 먹는 빵,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잘라 먹으려면 거의 갉아 먹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우리집 슈톨렌은 5일 만에 동이 났고, 달력이 12월로 넘어갔다.
한번은 귀갓길에 호떡을 사 먹었는데 집에 가는 내내 '슈톨렌보다 호떡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동네 호떡은 하나에 1,500원. 종이컵에 담아준 호떡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집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호떡을 매일 한 개씩 사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조금 더 내 취향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모든 꾸준한 일들이 그렇듯이 귀갓길에 매일 호떡을 사 먹으려면 성실해야 하고 심지어 행운도 따라야 한다. 호떡집이 문 닫은 다음에 내가 귀가할 때도 있고, 길을 한 번 건너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생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잊고 있었지만, 나는 체지방률을 줄이고 싶으니까.(중요한 건데 자꾸 누락되는 이유) 그런 이유로 아직 한 번밖에 못 먹었지만, 겨울은 늘 호떡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계절 아닌가 한다.
이렇게 제철 음식들 얘기를 하니 말인데 '제철 원고'라는 말도 가능할까? 호떡에서 원고로 넘어오고 보니, 같은 제철 얘기를 하면서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난다. 이 변화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정색'쯤 되지 않을까? 제철 감각이란 제철 음식에 적용할 때와 제철 원고에 적용할 때는 전혀 다른 기분을 불러오는 것이다. 철따라 음식을 찾아 먹을 때는 어딘가 낭만을 알뜰살뜰 챙기는 느낌이 나는데, 제철, 그러니까 마감 기한 안에 원고를 넘기는 과정은 딱히 낭만적이지도 알뜰살뜰하지도 않다. 제철 음식이 주는 삶의 풍미 같은 것은 완전히 휘발되고 남은 골조 그 자체랄까.
그 시기에 꼭 써야 했던 소설, 그 시기여서 가능했던 글, 그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지만 이러한 감각이 현재형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늘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아 그 소설은 그때의 나만이 쓸 수 있었던 것이구나, 지금이라면 못 쓸 소설이었구나, 하는 기분이 과거형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원고에 제철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의 마음은 아무래도 어떤 글의 창작이나 발표나 출간 시점이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내내 의식하는 그 제철, 바로 '마감일'로 수렴된다.
마감일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믿는다) 일단 청탁서에 적힌 마감일, 그것은 1차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외부가 어디지? 여하튼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1차 마감일. 그리고 그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 혹은 당일, 혹은 이미 지나간 후에 편집자와 조율하게 되는 2차 마감일이 있다. 이는 내부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내부가 어디지?
아무튼 삼중 구조니까 마지막 한 겹의 마감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마감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다니 나도 참 간이 크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수많은 편집자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다!'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 변명하자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당연히 나는 1차와 2차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솔직히 진심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편집자가 하루를 더 주시면 그래도 살 만한 세상임을 재확인하고 그럴 정도다. 이 3차 마감일은 신축성이 아주 좋아서 처음에는 1차 마감일에 근접해 있고 심지어 1차 마감일보다 더 이르게 설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스타킹처럼 탄력성 있게 혹은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 완전 막다른 골목의 가로등 위에 대롱대롱 걸려 있기도 하다. 그런 꼴은 나도 정말 보고 싶지 않다. 마감의 삼중 구조 같은 것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왜 반복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쓰는 중이다. 놀랍게도 아직! 1차 마감일이 되기도 전이다. 와아, 나는 프로다!
보통은 이쯤에서 원고를 덮어놓고 잠시 숨을 돌리다가 순식간에 2차 마감일까지도 흘려보낸 후 막다른 골목 앞에서 쪼그리고 울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기로 한다. 프로답게 끝장을 봐야지.
소설가의 마감식에 대해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꼭 하나는 '펑크식'으로 채우리라 생각했다. 펑크식! 말은 띄워놨는데 정체가 모호하다. 그 음식 먹고 펑크를 잘 냈다, 는 줄거리가 되어야 하나? 그게 그렇게 소문낼 만한 일인가? 다소 접근이 어렵지만 '펑크식'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그것을 발음하고 활자로 표기할 때 오는 일종의 쾌감 때문이다. 펑크라는 말에는 아주 시원한 지압 돌기 같은 게 달린 느낌이라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진다. 한번 외쳐보세요, 펑크! 펑크! 활자의 생김새에도 어쩐지 저항정신이 깃든 것 같지 않은가?
어쩌면 펑크가 금기어처럼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작가든 편집자든 혹은 마감철, 그러니까 제철 원고의 세계에 연루된 누구든 비슷할 것 같다. 펑크에 대해 사적으로는 종종 말하면서도 정작 업무 메일이라든가 업무 관련 통화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펑크를 펑크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고? 두렵기 때문이지, 진짜 그것이 올까 봐.
글쎄, 성급한 일반화일까? 솔직히 다른 작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 경우엔 확실히 메일에 '펑크를 원합니다.'라든가 '이번 호는 펑크입니다.', '펑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장을 써본 적은 없다. 말하면서 입 밖으로 내보낸 적은 더더욱 없다. 공식적인 메일이나 전화에서는 '펑크'라는 말을 쓰면 내게 뭔가 들러붙을 것만 같아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놓고 친구들에게는 "마감 못해서 지금 펑크 직전이야! 아 펑크야, 펑크!" 오두방정을 떨어댄다.
사실 내가 펑크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펑크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래전 펑크를 시도했다가 반려 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너무 임박해서, 이미 펑크를 대체할 어떤 시간도 없는 박복한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바로 그 타이밍에 내가 편집자에게 메일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생애 첫 펑크에 관한 메일이었다. 마감 연장 부탁이 아니고, '펑크'란 말을 쓰지 않았을 뿐, 펑크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메일을 고심하며 썼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영화를 보고 왔다. 맥주도 마셨다.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마터면 마우스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편집자가 며칠 기한을 더 줄 테니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세상에나 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했다. 이건 펑크 반려 메일이었다. 펑크를 시도하면 무조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어찌나 좌절했는지.
거기서 한 번 더 '펑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채 펑크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만큼의 에너지와 확신이 내게 남아 있지 않았기에 나는 결국 계속 쓰기로 했다. 어쨌건 이틀이 더 생겼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자 내가 까먹은 오늘 하루가 너무 아까워 미칠 것 같았다. 뭔가 투자 실패한 기분. 그러나 놀랍게도 하루 동안 원고와 멀어졌더니 우리 사이의 권태기가 회복된 것인지, 그 원고를 새롭게 들여다볼 마음이 생겼고 결국 원고를 발표할 수 있었다.
제철 원고가 되지 못해 파산을 선언했으나 접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틀 만에 부활한, 우여곡절을 겪은 그 원고는 지금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소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때가 아니면 쓰지 못했을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 문학 지면이어서, 그때의 나여서, 바로 그 계절이어서, 혹은 내게 이틀을 더 주셨던 그 편집자여서 탄생이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 제철 원고라는 것이 너무나 오묘하게 느껴진다.
물론 과거형이니까 가능한 감정, 현재형 제철 원고의 압박은 무서워 죽겠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윤고은(소설가)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쓰는 동안, 입은요?] 파이팅... 파이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d/1/9/dd19b9b2b6db66494e1d2d0146703d57.jpg)
![[쓰는 동안, 입은요?] 천사들의 식탁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1/7/8/b17872efcb9af577de5e7f2ac047d79c.jpg)
![[쓰는 동안, 입은요?] 언제나 이 정도의 공간밖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2/c/c/22ccd58044833ea6b86095fe680c444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