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님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생각한 뒤로, 저는 계속 '오래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책, 오래전의 메일, 오래전에 작가님을 스쳤던 그날의 스산한 날씨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오래전이라. 헤아려보니 13년 전의 일입니다.
숲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라고 시작한 소설은 "노래할까요"라고 끝납니다. 작가님의 소설 『百의 그림자』입니다. 소설을 단숨에 다 읽고 나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 느낌을 오래전의 어느 날에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나와 당신은 아픔도 다르고, 기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물론 이상향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같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심. 작가는 그것에 대해 조용히 읊조리고 있다. 어떤 것이 진심인지는 모두가 안다. 그 진심을 찾아가는 과정. 그 진심이 왜곡되고, 그 진심이 버림받고, 그래서 그 진심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그 진심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심의 희망. 그것이 왜 가치로운 일인지, 그것이 경제 원칙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한지, 소설 속의 무재 씨와 은교 씨의 사랑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동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당신이 품고 있는 당신의 진심이, 정말 진심이라면 작가의 진심도 정말의 진심일 것이다. 그 진심을 서로 안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진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말이다.
작가님은 이런 답장을 주셨죠.
— 이 글을 첫 리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말씀하신 내용도 제게 소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이 소설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였습니다. 신형철 평론가는 "고맙다. 이 소설이 나온 것이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책을 읽기 전에는 평론가의 찬사가 조금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독자에게 강요한다는 생각을 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니, 독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들도 분명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을 작가님이 제게 건넨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세상에 갓 두어 권의 책을 내놓은 햇병아리 소설가였는데, 그래서 얼마간은 의기소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밑도 끝도 없는 열정만 가득한 채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작가이기도 했을 터인데, 그래서 10년 뒤나 13년 뒤의 제 모습 따위는 상상할 줄도 모르고, 상상한다 해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고 감히 생각했을 것이 뻔한, 한마디로 얼뜨기 소설가였는데 작가님에게 받은 저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작가가 독자에게 으레 건네는 말이자, 작가가 동료 작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사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작가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제게 와닿았다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여서 그랬을까요. 여러 아름다운 꾸밈말을 더한 '고맙다'가 아니라 그냥 '고맙습니다', 저 다섯 글자여서 그랬을까요. 꼿꼿하고 견고하게 읽히는 저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저는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데에는 그저 진심이 담긴, 진심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쓴 글에는 이런 구절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껏 어떤 소설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압축을 본 적이 없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잔혹하거나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고, 치열함을 가장해서 아픈 딱지를 후벼파지 않아도, 두 인물이 말갛게 앉아서 한곳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작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다니. 서사의 힘을 서정으로 치환한 감동을 만들어준다. 악다구니 치는 인물만 삶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한다. 그건 일종의 충격이었다.
그 충격은 사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시대의 명작, 소설가가 뽑은 소설, 동료 작가가 뽑은 가장 훌륭한 2000년대 소설 등의 투표 기회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작가님의 『百의 그림자』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2000년대 최고 소설은 단연 『百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 작가님과 제가 같은 시대에 함께 소설을 쓰는 동료여서. 그리고 행복합니다. 작가님의 신간을 따라 읽을 수 있는 같은 시대의 독자여서.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작가님이 새 작품을 세상에 내보일 때마다 큰 보폭을 씩씩하게 넓히고 있는데, 작가님을 흠모하는 독자로서, 또는 동료 작가로서의 저는 마냥 늘 제자리인 듯싶어서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겨운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세상 가까이 다가가는 글을 쓰는 것이 소설가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무래도 너무 부족한 작가인 듯해서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특히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깊게 느껴지는데, 그건 제가 작가님을 존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너무 소중하여, 저는 오래 들여다봅니다. 거기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펄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봄이 있고 키 작은 여인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글에 매몰되어 어쩌지 못하는, 오래전의 글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디디지 못하는 키 작은 여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여인은 오래전에 받은, 고맙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진심을 받고, 진심을 건네는 이의 진심을 읽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진심을 믿었다는 것이, 어쩌면 나는 아직 엉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어쩐지 오늘 밤에는 새 소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가님을 직접 만나는 날에, 저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건재해 주어 고맙다고, 좋은 작품을 계속 쓰고, 계속 독자에게 보여주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기껍게 작가님의 소설을 기다릴 수 있는 행복을 알려주어 고맙다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물 속에 갇힌 여인의 읊조림처럼 소설이 내 마음처럼 안 나아갈 때, 청승맞은 울음소리처럼 소설이 지겨워질 때, 우물 밖은 지옥이라며 더욱 땅 밑으로 파고들어 갈 때마다 저는 무재 씨와 은교 씨의 목소리를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성큼성큼 걸어가며 무재 씨가 말했다.
무서워요, 나도.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도 무섭지 않도록 작가님의 소설로 연결해 주세요. 묶어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 소설을 만나게 해주세요. 작가님에게 더 고마워할 수 있도록. 마음껏 고마워할 수 있도록.
2023, 봄
김이설 드림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이설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잃어버린 이름에게』, 『누구도 울지 않는 밤』, 경장편 소설 『나쁜 피』, 『환영』, 『선화』,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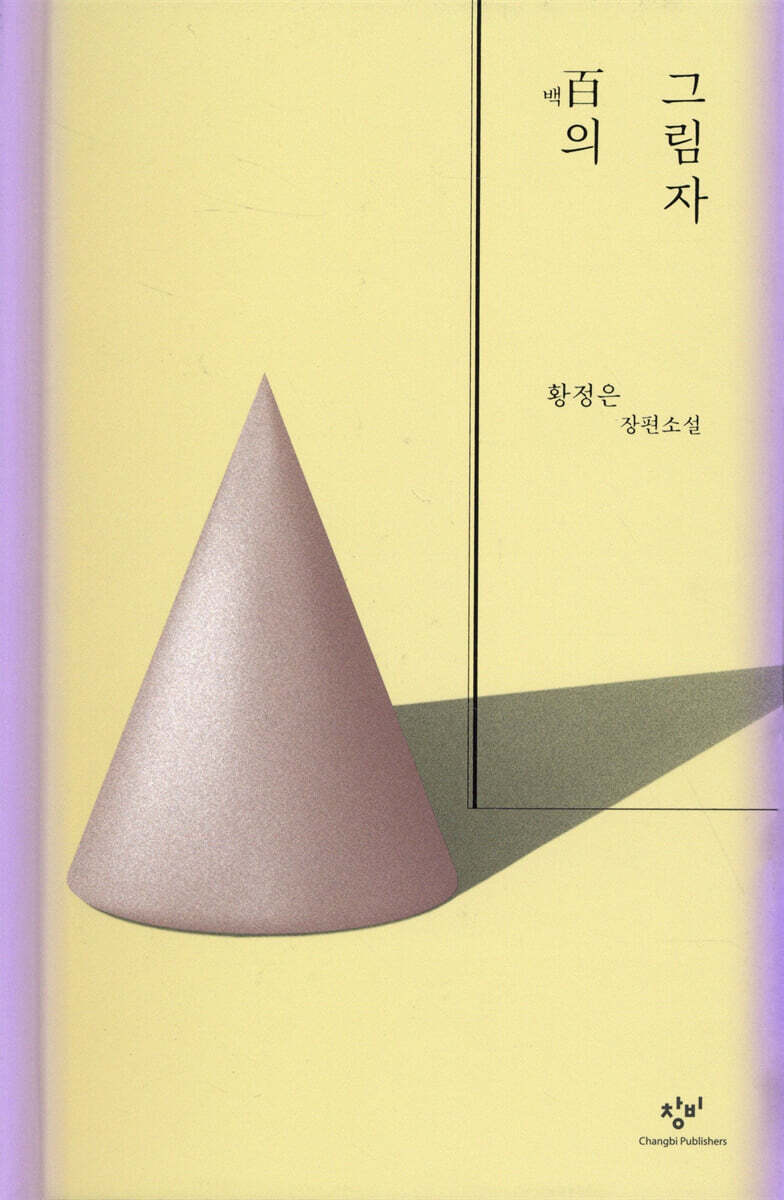
![[신간을 기다립니다] 이수명 시인께 - 황인찬 시인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1/c/8/a/1c8ab3f876050c90f30b12c46b8c79dc.jpg)
![[신간을 기다립니다] 윤이형 작가님께 - 정용준 소설가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1/7/f/a17f817d8207c5ecf0701ee34fa7f8bb.jpg)
![[신간을 기다립니다] 앙꼬 작가님께 - 정원 만화가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b/2/d/7/b2d78c764c28c0ba59b11a4c4d9da374.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서점 직원의 선택] 새해를 함께 시작할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6-a898fdd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