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콘텐츠가 기존의 콘텐츠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대중들에게 던지면 많은 경우 댓글을 손에 꼽곤 합니다. 독자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대중의 의견을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웹 콘텐츠의 상업성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옛날엔 댓글이 없었나요? 그리고 독자들의 목소리가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오래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34년 7월 24일. 소설가이자 시인 이상이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라는 시를 연재합니다. 이 시는 잘 아시겠지만 난해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게 무슨 시냐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30화까지 연재하려던 애초 기획과 달리 15화 만에 연재가 중단되지요. 출판만화 잡지 시절에도 독자들은 자신의 감상을 엽서에 써 편집부에 보냈습니다. 그럼 작가는 편집부를 통해서 그 팬레터들을 바로바로 확인하게 되지요. 때로는 다음 편을 그리던 중에 이전 편에 대한 아쉬운 점을 받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독자들의 목소리를 받는 건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댓글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소설의 반응이나 웹툰의 반응이 즉각적인 건, 웹툰과 웹소설의 연재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1주일에 한 번 연재되는 신문 연재소설의 경우, 우편을 통해서 2~3일에 걸쳐 다소 늦게 소설의 피드백이 취합되더라도 ‘다음 편’이 연재되기 전 의견이 작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댓글’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가?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 콘텐츠 시장의 특징은 ‘댓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요하는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댓글을 ‘여과’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독자의 의견 중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는 목소리만이 편집부에 의해서 잡지나 신문에 게재되지요. 또 이러한 목소리는 독자의 의지에 따라 보거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에선 대부분의 댓글 보기가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편을 읽으면 다음 편을 읽기 전 무조건 베스트 댓글과 마주해야 하지요.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문피아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러한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웹소설 플랫폼에 국한된 이야기만도 아니지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영상 하단부엔 베스트 댓글이 자리하니까요.
생각해 보면 베스트 댓글이라는 개념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베스트 댓글은 독자들의 ‘댓글 작성의 노동’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플랫폼에 착취되는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웹소설에 편당 1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하는 건 작가의 소설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정도 길이의 글은 100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작가의 글이 독자들에게 ‘목격’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댓글은 어떤가요? 댓글은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독자들의 순수한 감상이자 즉발적인 목소리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댓글은 훌륭한 보조기억장치이자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자신이 읽었던 작품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다른 독자들이 까먹은 내용을 보충해 주는 한편 그들이 느낀 감상을 훌륭한 언어로 정리해 주지요. 그리고 이러한 댓글은 플랫폼의 UI/UX 디자인과 결합하여 마치 소설과 똑같은 지위로 연속되어 목격됩니다.
이때 독자들이 느끼는 감각은 어떻게 변할까요? 비록 웹소설 플랫폼에서 디자인적 측면에서 소설과 댓글은 일부 구분되어 있으나, ‘독서’라는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즉 한 편의 소설 속에서 ‘베스트 댓글’의 내용은 소설이라는 곳 안에 자연스럽게 귀속되어 함께 읽히는 것과 다름없어지며, 독자는 ‘작품’과 함께 ‘작품에 대한 대중의 평가’ 역시도 마치 작품처럼 읽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작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작가는 작품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까지 독자들에게 한 번에 전달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작품이 긍정적이면 작품과 함께 독자들의 긍정적인 댓글이 함께 전달됩니다. 그러니 예술적이거나 작가적인 시도보다는 상업적인 시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암암리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플랫폼은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돈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댓글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착취되는 노동이니까 말이지요. 웹 콘텐츠에서 댓글이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플랫폼이 강하게 주장하는 메시지에 완전히 빠져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웹소설은 이러한 댓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웹소설 업체에서 이러한 댓글은 양날의 검입니다. 소설의 스포일러를 댓글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 특정 댓글을 삭제 처리하거나, 또는 독자의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지 않도록 작가가 매 화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즉, ‘독자의 목소리’를 없애 버리고 ‘작가의 목소리’를 채워버리는 방식이지요. 노벨피아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댓글 공간을 이모티콘 중심의 놀이 공간으로 바꾸어 새로운 아마추어 문화장을 만들기도 했고, 문피아의 경우 악플로 인해 자살한 작가 사례가 있어 가급적 악플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가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결국 작가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댓글을 유념하고 공존하거나, 또는 배타적으로 인식한 채 나아가거나 결정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그 자체가 웹소설로 창작된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지놓 작가님의 『소년만화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 작품은 댓글의 성질을 잘 보여준 메타적 소설인 동시에 장르 작가들이 유년기에 많이 소비했던 ‘소년만화’의 서사적 구조를 완전히 틀어놓은 안티 클리셰 소설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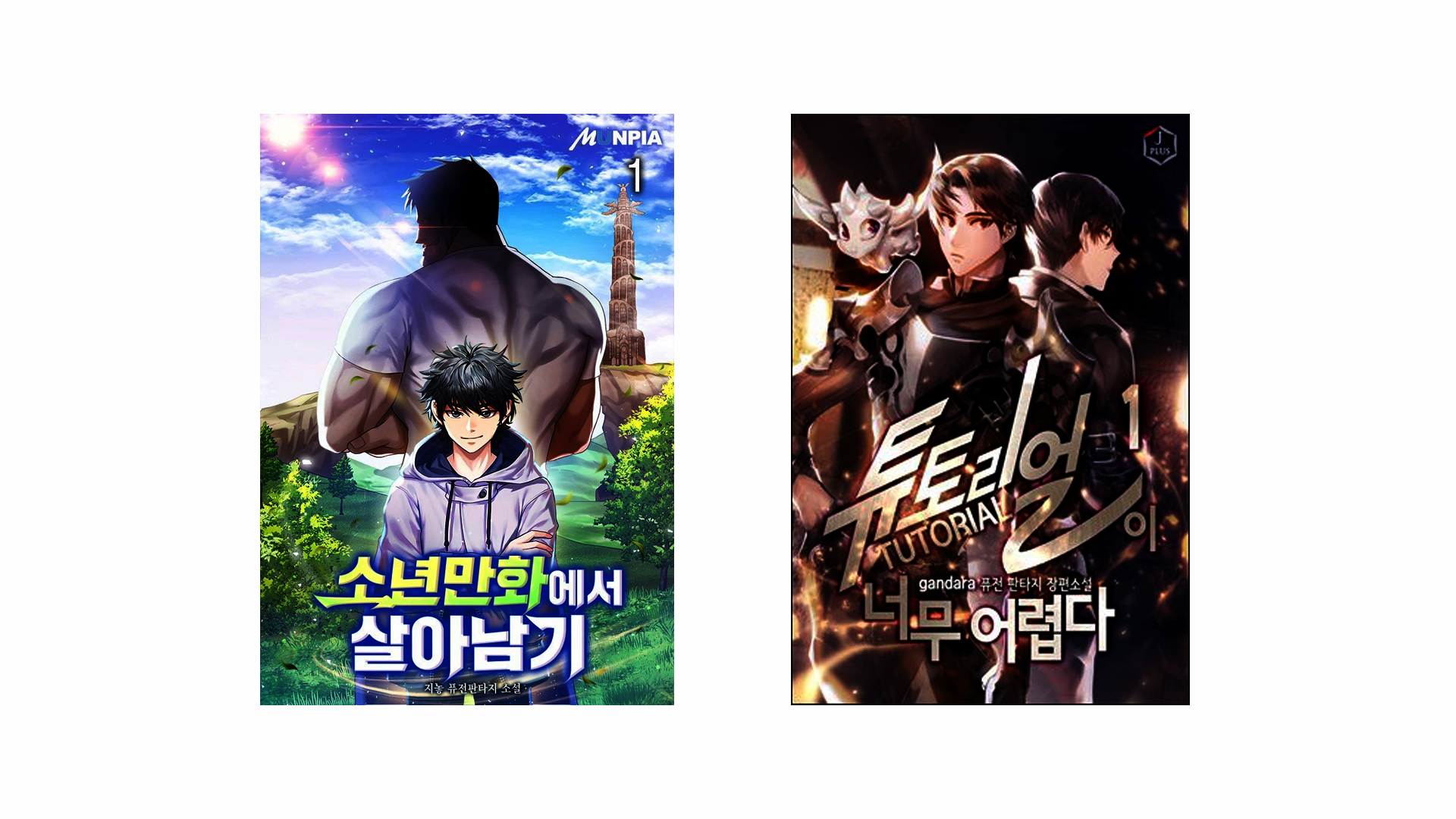
주인공 이희로는 어느 날 자신이 소년만화의 악당3으로 빙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고작 몇 컷 만에 죽게 되는 엔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독특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했지요.
그러나 제게 이러한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었던 부분은 주인공이 작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서사를 연출할 때마다 소설 속에서 ‘독자’의 존재가 암시되며 캐릭터의 생명력이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이 잇따랐습니다.]
[인지도가 1,459 증가했습니다]
[작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놓, 「변화」, 『소년만화에서 살아남기』)
이외에도 서사의 내용을 지켜보는 ‘시청자’나 ‘관객’의 존재가 독자의 생명력을 연장시킨단 상상력은 gandara 작가의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같은 시선물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은유지요.
댓글을 둘러싼 구조를 보아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웹소설의 성질들도 사실은 그렇게 느끼길 바라는 플랫폼이나 기획자들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작가들은 그러한 의도를 무의식중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느끼며 작품을 통해 풀어내지요. 그러니 웹소설의 구조와 도식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댓글을 가지고 유희하는 작품을 한 편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소년만화에서 살아남기
출판사 | 문피아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출판사 | 제이플미디어

이융희
장르 비평가, 문화 연구자, 작가. 한양대학교 국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006년 『마왕성 앞 무기점』으로 데뷔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장르문학을 창작하고 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소설 창작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장르 비평 동인 텍스트릿의 창단 멤버이자 팀장으로 다양한 창작, 연구,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







![[리뷰] “세속적이다. 하지만 아름답구나”](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4-9e05911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