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화동로터리는 크게 세 방향과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동성고등학교 방향, 다른 하나는 우리은행 방향 그리고 동양서림 방향이다. 동양서림 방향에는 나무 네 그루가 서 있고 그들은 모두 플라타너스이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나, 두울, 세엣, 네엣이다.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는 이름이다. 속으로만 수를 세듯 불러보는 이름이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아름드리나무이므로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겠으나 내가 마냥 동생으로 여기는 까닭은, 지난봄 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하냥 귀여웠던 탓이다. 까까머리 동생 나무들은 여름쯤엔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성해졌고, 어제부터는 커다란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침 일찍 한바탕 쓸고 뒤돌아서면 도로 그만큼이 될 정도로 가득가득, 말라버린 지난 계절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 비질을 끝내고서야 나는 아, 겨울이다. 한다.
서점의 겨울을 알려주는 것은 매캐하게 풍기는 나무 타는 냄새이기도 하다. 서점 근처에는 겨울마다 찾아오는 군고구마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는 봄이면 사라졌다가 겨울이면 나타난다. 그러하길 족히 십 년도 넘었다고 들었다. 나는 그가 봄 여름 가을 동안 무얼 하고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말이 적고, 무엇에든 별 관심이 없다. 나는 그를 노송 같다 생각한다. 노인임은 분명한데,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 까닭이다. 작년 언제쯤, 군밤을 사러 갔다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새로 휴대전화를 장만했는데, 글씨가 작아 도통 읽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 했다. 설정을 찾아 그의 새 전화기의 이것저것을 만지다 저장된 전화번호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전화번호가 달랑 하나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그만 웃어버릴 뻔했는데, 그 번호의 이름에 ‘선녀’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따금 그가 나무를 구하러 갈 때면 선녀님이 그 자리를 지키곤 한다. 그때마다 선녀님, 하고 알은체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느라 애를 쓰곤 한다.

겨울이니까 다섯 시만 넘어도 간판 불을 올려야 한다. 월요일이라, 하나뿐인 직원도 쉬고, 동양서림 대표님도 일찍 퇴근하니 혼자서 동양서림과 위트 앤 시니컬을 같이 돌봐야 하는 처지이다.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아니면 마음 바쁜 날이어서인지 독자들이 뜸하다. 서점에 손 적은 날은 당최 이유가 없으니,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오늘은 한가하겠군” 하고 중얼거리게 된 지도 벌써 꽤 오래되었다. 나는 군밤을 한 봉 사서 우물거리고 있다. 대체 어디서 자란 밤이기에 이렇게 단 것인지 모르겠다, 따위의 생각이나 하면서. 벌컥 문이 열리더니 들어서는 이가 있다. 그는 어디 살필 것도 없다는 듯 성큼성큼 계단을 밟고 위트 앤 시니컬로 올라가버린다. 나는 그의 사정이 궁금하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터이니, 남은 군밤이나 마저 먹는데,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품 가득 시집을 안아 들고 내려온다. 어째 목마른 사람이 물동이를 든 것 같은 폼이다. 하도 궁금해서 이 많은 시집을 어디에 쓰시게요, 하고 묻고 말았다. 직장 일이 너무 힘들었다 한다. 그런 겨울밤엔 (그는 “겨울밤”을 길게 발음했다) 이불 뒤집어 덮고 시를 읽다가 잠들어야지요 한다. 근사한 밤이 되겠네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런 밤이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밤.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모르고 싶어서 시를 읽는 겨울밤. 길게 발음해야 하는 그런 겨울밤. 나는 창문에 붙어 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래 본다. 두울과 세엣 사이를 지나 네엣 가까이 갈 때쯤, 그의 뒷모습은 군고구마 리어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묵묵히 군밤을 까는 중이다. 그가 골라간 것 중에는 나의 시집도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시집이 긴 겨울밤과 잘 어울렸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찬 바람소리 닮은 것이 되었으면 하고 쓴 시도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없다. 다음에 찾아올 때는 내 시집이 어땠는지 말해 주기로 했으니, 그가 오늘 안고 간 시집들을 얼른 읽었으면 좋겠다. 시인이 서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이런 이점도 있다.

그러고 나서는, 깜깜히 앉아서 서점의 겨울 채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때 동그랗고 튼튼한 강철 난로를 하나 가지고 싶었다. 그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뽀얗게 올라오는 김을 구경하면서 김이 서리는 창문 같은 겨울을 보낸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서점에 난로라니 불이라도 나면 어쩔 것이냐는 핀잔을 듣고 냉큼 접어버린 바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서점은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귤 한 상자, 핫팩, 크리스마스 장식 따위를 떠올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젓는다. 시집만 한 것이 있겠는가. 겨울에는 시집이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 시집서점에 무슨 월동이란 말인가 마음 먹게 되는 것이다. 일단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홀짝홀짝 시집을 넘겨보다가 잠들어야지. 눈사람 여관*에 찾아드는 마음으로 그러하기로 한다.
서점 문을 잠그고 돌아서니 바닥은 하나 두울 세엣 네엣이 어질러놓은 한때의 기억들로 요란하고, 군고구마 리어카는 주인 없이 식어가고 있다. 겨울이다. 근사한 나의 계절.
* 이병률 시집『눈사람 여관』(문학과지성사, 2013년)에서 인용
-
눈사람 여관이병률 저 | 문학과지성사
온전히 혼자가 되는 일은 자신을 확인하고 동시에 타인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에게서 오는 감정이란 지독한 그리움이고 슬픔이지만,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일이 곧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내면의 힘이 된다.
눈사람 여관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유희경(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 「별을 가두다」가,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가 당선되며 극작가와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 있으며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시 동인 ‘작란’의 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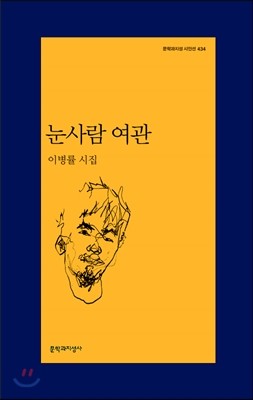




![[인터뷰] 김민정 시인 “오롯이 시인으로만 한 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3-d6e91747.jpg)
![[리뷰] 여성들의 로맨틱한 성장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26ddf5f5.jpg)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문화 나들이] 지천이 알록달록한 4월, 자연스러움이 그립다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4-0b8e7acb.jpg)




봄봄봄
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