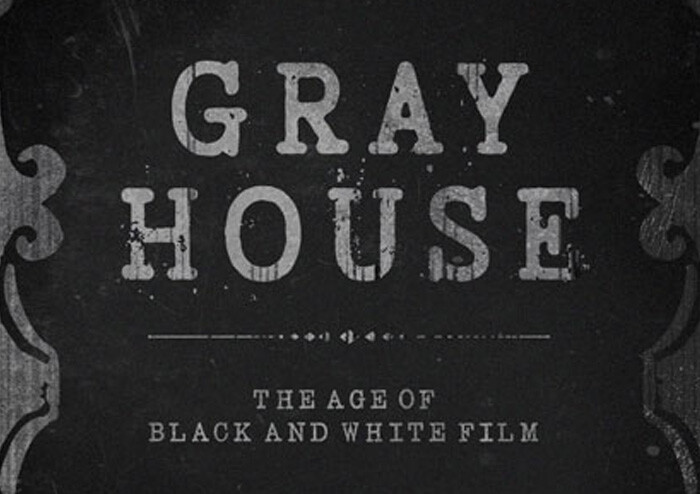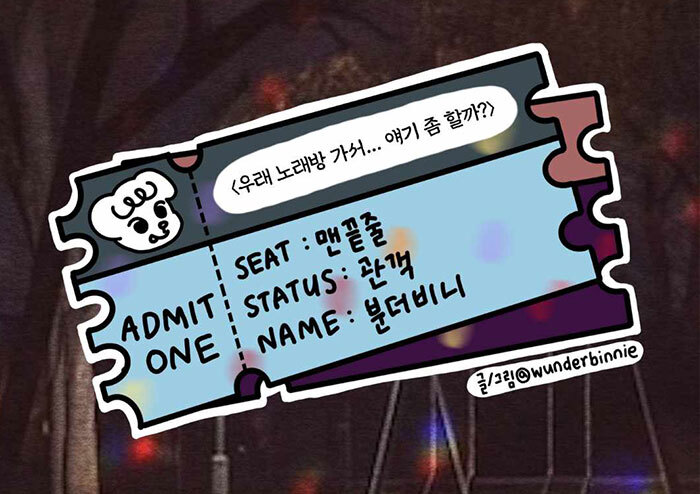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 작품의 완성도 혹은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과는 무관하게 특정 장면이 엉뚱하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그 순간은 대개 영화의 큰 줄기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장면이 관람자의 사적인 경험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것 같다. 영화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은 채, 한 장면에서 시작된 단상을 자유롭게 뻗어가 보려고 한다. |

“여긴 어딘가요? 난 길을 잃었어요.” 다이애나 스펜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왕실 가족이 모이는 별장으로 가는 중이다. 별장 주변에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옛집도 자리한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로 향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목적지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인다. 아니, 목적지를 ‘잃기’ 위해 홀로 무모하게 차에 오른 것일까. 스펜서는 별장에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보다 그곳과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진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다. 이 도입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잃은 자의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팽만하다. 비밀로 둘러싸인 왕실 내부와 그곳에 갇힌 한 여인의 내면, 그러니까 출구 없는 ‘안’의 미로. <스펜서>는 그 미로의 암담한 입구에서 시작한다.
이 내부는 어떤 곳인가. “최소의 소리만 낼 것. 그들이 들을 수 있음.” 요리사들이 왕실 일가의 만찬을 준비하는 커다란 부엌 한구석에 붙어있는 문구다. 이 말은 조용히, 이 별장의 폭력성을 지시한다. 왕실 남자들이 요란한 총소리로 자연의 고요를 깨뜨리며 스펜서를 놀라게 하는 사냥 장면과도 대비된다. 왕실 일가가 아닌 자들의 목소리는 물론 옅은 존재감도 허용되지 않는 장소. 다이애나 스펜서는 무모하게도 이런 곳에서 ‘다이애나’를 벗고 ‘스펜서’가 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가 거듭될수록 그는 ‘다이애나’도 ‘스펜서’도 아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존재로 유령처럼 별장 주변을 떠돈다. 이건 그저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다.
그는 왕실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이나 식사하는 장면에 등장해도 거기 스며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가 그들의 위선을 관찰하는 눈으로 화면 중심에 당당히 위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거의 언제나 뒤늦게 나타나 가까스로 버티며 화면에 기이한 얼룩을 만들다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퇴장하지 못하고 줄곧 화장실 변기에서 구토하는 모습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요컨대, 여왕과 왕실 일가의 만찬 장소에서 그가 남편이 준 진주 목걸이를 목을 옥죈 무거운 쇠사슬 인양 힘겹게 잡아당기는 대목은 그의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장면이다. 사람들은 그를 흘낏흘낏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이어가는데, 그때, 목걸이가 끊어져 진주알들이 수프에 떨어지고 그가 게걸스럽게 그걸 삼키고 씹는다. 이 순간은 더없이 가혹하지만, 왕실의 가식적인 공기를 그로테스크하게 깨뜨리는 통렬함 또한 안긴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행동은 그의 망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그는 드레스를 입은 채, 화장실 변기를 부여잡고 있다. 진주 목걸이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곳에는 어떤 출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각인된다.

파파라치는 다이애나 스펜서를 훔쳐보는 데 혈안이고, 왕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듯 군다. 두 경우 모두 그는 과잉되고 왜곡된 시선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커튼은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활짝 열려 그를 노출하거나 완전히 닫혀 그의 흔적을 지운다. 그의 말대로 ‘미래’가 없는 이곳에서 왕실 사람들만 그를 유령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점점 유령에 가까워진다. 비쩍 마른 몸으로 혼자 저택 주변을 미끄러지듯 배회할 때, 영혼 없는 인형처럼 왕실이 정해준 화려한 옷을 입고 벗을 때, 먹은 걸 다 토해내고 주방 창고에 들어가 도둑처럼 몰래 음식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을 때, 이곳은 인적 없는 귀신 들린 집처럼 음산하다. 그는 마치 한을 풀지 못한 귀신처럼 밤마다 자꾸만 별장을 빠져나와 어린 날 살던 집을 찾아가려 하는데, 경찰에게 발각되자 이렇게 말한다. “저를 유령으로 대해주세요.”
그의 눈에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이자, 왕의 모략으로 처참하게 죽은 앤 불린의 망령이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는 앤 불린의 비극적인 운명에, 어쩌면 완전히 죽은 것도, 완전히 산 것도 아닌 ‘유령’의 상태에 친연성을 느낀다. 그가 마침내 방문한 옛집은 폐허가 된 지 오래지만, 그곳에서 재회한 앤 불린의 유령이 그의 죽음충동을 막는다. 영원한 족쇄 같던 진주 목걸이도 마침내 끊어진다. 그러니 여기는 다이애나 스펜서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하고 자유로운 바깥일까. 그렇게 보기에 스펜서의 추억을 간직한 이 집은 앞이 보이지 않게 어둡고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져 있다. 이곳은 그저 과거에 멈춰 있다.
영화 말미, 다이애나 스펜서는 왕실 관습에 따라 사냥 총을 든 아들들을 구해내기 위해 맨몸으로 현장에 뛰어든다. 도입부에서 그가 언덕 허수아비에게서 벗겨내 보관해온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입은 채 바로 그 허수아비처럼 팔을 휘저으며 사냥을 방해한다. 처음으로 그는 내면을 갉아먹는 대신, 과격한 행동으로 왕실의 전통을 중지시킨다. 그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문을 찾은 걸까. 그가 두 아들만 데리고 도심으로 돌아와 패스트푸드 가게 앞에서 주문자의 이름을 당당하고 경쾌하게 말한다. “스펜서.” 다이애나 스펜서의 비극적인 끝을, 그 바깥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내게 이 말은 그저 애처롭게만 들린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남다은(영화평론가, 매거진 필로 편집장)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생을 향한 환희의 순간 - <나의 집은 어디인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d/f/1/edf11952407c99239e13d0de7a777a1f.jpg)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혈연 바깥으로 나가는 여성들 - <패러렐 마더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9/e/3/a9e3df99f0b752e665833c70f5bbb6fc.jpg)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한없이 투명한 ‘수학의 시간’ -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3/c/f/73cfe469069fa3f0ed6d1670fb0232f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