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스플래쉬
20대 취업 준비생과 짧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탐색 중이라고 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였지만, 줄여 말하면 내 맘 나도 몰라 우왕좌왕. 밝은 낯빛임에도 불구하고 말 속에 어지간히 넓은 그늘이 있었다. 자신은 분명 미래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치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 마음이 불안해지고 속이 상한다는 말을 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냐고 나에게 항변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정답은 짧게. 나는 최근 들어 알게 된 인생의 기쁨 몇 가지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기. 방바닥에 등을 쩍 붙이고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잠도 자지 않고, 음악도 틀어놓지 않고, 휴대전화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누워 있는 일. 그때 머릿속에 들어와 부풀리게 되는 생각, 그 순간 마음속에 들어와 어루만지게 되는 감정, 그 시간 입안에서 맴돌아 발음하게 되는 언어가 가져다주는, ‘인간은 어째서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기 힘든가’와 같은 성찰은 근사하다. 성찰하는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일의 즐거움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린 건지. ‘생활형 인간’인 채로는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사이의 풍경’은 또 어떤가.
당신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어폰을 꽂은 채 줄곧 어슴푸레한 창밖을 내다보고 있군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태운 7019번 버스는 이제 막 시립은평병원을 지났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왔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이어폰을 재차 매만집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그 노래를 나도 좋아합니다
…
우리는 헤어집니다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이
나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소란입니다
-박소란 지음, 『한 사람의 닫힌 문』 중 「모르는 사이」 부분
한 사람이 버스의 이편에서 저편에 앉은 모르는 사람을 궁금해한다. 저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노래를 듣고 있을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 이름이 뭘까…. 퇴근길 버스에서, 한밤의 버스에서 나도 종종 해본 일이다. 달리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이동 수단에 몸을 싣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다가 불쑥, 잠시. 그 제자리, 걸음이 실은 나에게서 떨어진 타인을 관찰하며 나를, 나의 생활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일임을 안 직후부터 나는 타인에게 열린 이목구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목구비가 활짝 열려서 끝까지 듣고, 숨은 것까지 보고, 필요할 때 말하고, 함께 호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탄생 배경에는 그러니까 멍해지는 순간이 필수적이다.
부산한 생활의 오선지에서 벗어나 제멋대로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음표가 바로 ‘멈춤’임을 나는 뒤늦게 알아챘다. 해야 함 속에서 발견하고 얻게 되는 재미와 의미만큼이나 하지 않음 속에서 찾게 되는 재미와 의미를 일찍이 ‘곰돌이 푸’는 이렇게 짧게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되지.”
언젠가 한 마을 청년 프로젝트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청춘에 관하여 “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를 대개들 청춘이라고 말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청춘은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어디쯤 왔나, 어떻게 이곳까지 왔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나만 이곳까지 왔나, 다른 이들은 어디에 있나, 멈춰 서서 둘러봐도 늦지 않는 때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게 또한 청춘이 누려야 할 기쁨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도 생각한다. 인생은 멈춰 설수록, 제자리걸음을 자주 할수록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이라고.
어제는 퇴근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길이 멈춰져서 꽃이 활짝 핀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홀로인 듯 여럿인 희고 풍성한 생의 감각에 몰입하여 자문해보았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소란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 “당신이 눈을 준 이 저녁이 조금씩 조금씩 빛으로 물들어간다.” 인사하고 싶었다. 나는 김현입니다.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되었다.
-
한 사람의 닫힌 문박소란 저 | 창비
‘한 사람의 닫힌 문’이라는 제목을 통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게 만든다. 무언가가 문 저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문 이편의 삶이 조금은 견딜 만해진다고 시인은 말한다.
한 사람의 닫힌 문
출판사 | 창비

김현(시인)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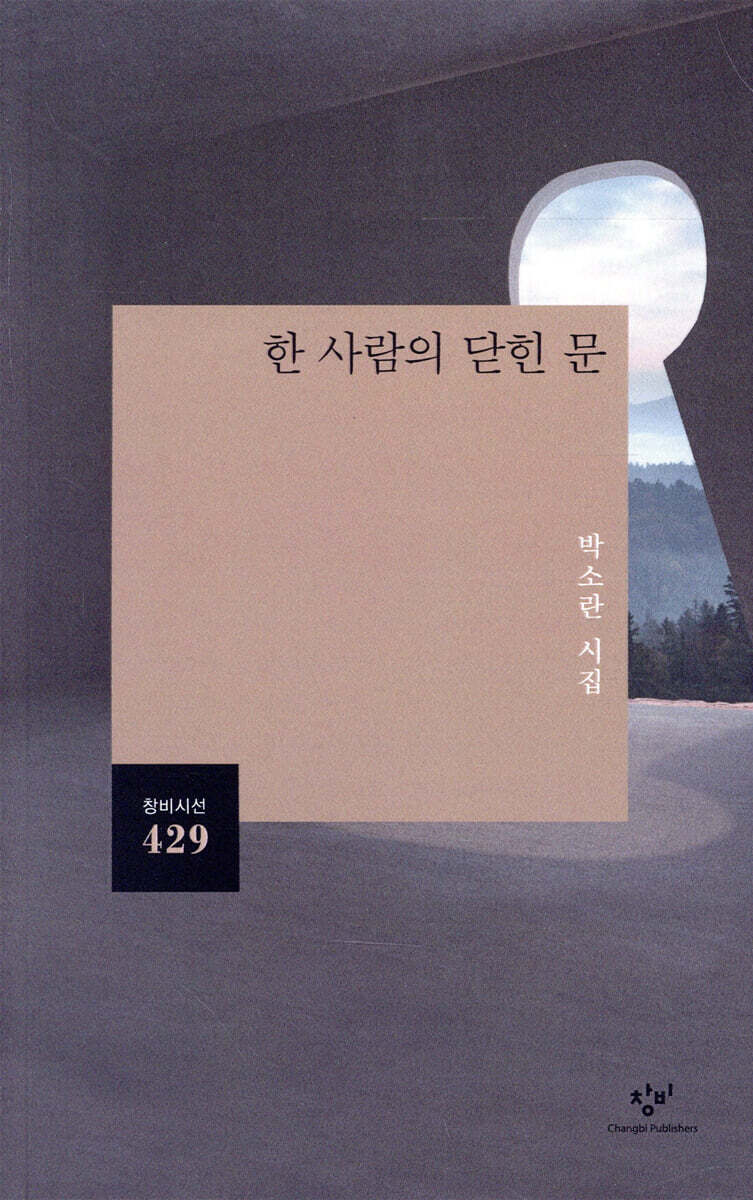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계속 읽기』,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7-e6d95ade.jpg)
![[둘이서] 서윤후X최다정 – 내 방 창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7f862cf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