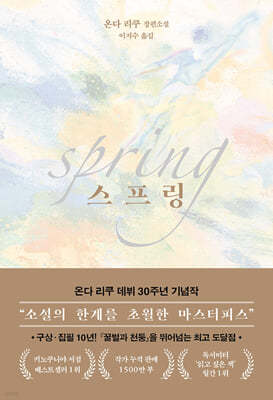2016년 『꿀벌과 천둥』으로 일본 문학사상 최초로 나오키상과 서점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30년 경력의 소설가 온다 리쿠. 데뷔 3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그의 새로운 대표작 『스프링』은 출간 이후 각종 신문 서평을 통해 “소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진화한 소설” “단숨에 읽어낼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작품” 등의 찬사를 받았다. 독자 반응도 뜨거워, 출간 즉시 독자 서평 사이트인 독서미터에서 ‘읽고 싶은 책’ 월간 1위에 오르고, 일본 최대 서점 체인인 키노쿠니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노스텔지어의 마술사’로 불리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온다 리쿠는 『스프링』을 출간하며 『초콜릿 코스모스』와 『꿀벌과 천둥』을 이은 ‘예술가 소설’ 3부작을 마침내 완성했다.
『스프링』을 한국에 출간하시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일본에서 출간하고 얼마되지 않아 한국어판을 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출판사, 편집자, 번역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은 집필 과정에서 제목을 먼저 정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스프링’을 먼저 정해두셨나요?
네, 이번에도 처음부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발레가 테마라서 “이것뿐이다” 하고 ‘스프링’으로 결정했고, 주인공의 이름 ‘하루(春)’도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스프링’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뜻하기도 하는 ‘봄’의 의미가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작가님께서 이 단어를 작품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단어 spring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이번에는 발레 무용수가 주인공이라 부의 제목을 모두 동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4부의 제목은 ‘봄’이 아니라 ‘봄이 되다’로 정했습니다. 더불어, 봄은 부활이나 재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성을 마주한 인물들이 오싹함을 느끼는 장면, 공포와 패닉에 빠지는 장면이 작가님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듯합니다. 『스프링』의 미시오도 그렇고, 『꿀벌과 천둥』의 미에코도 그렇죠. 작가님께 천재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천재라는 것은 시대의 폐색감을 깨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참혹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천재가 나타나는 방식이나 주위에 미치는 영향에 흥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하루가 성장하는 길목마다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술가에게 있어 스승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치나 지도자라는 직업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은 가르침을 받는 일보다도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예술가를 낳고, 서로를 키워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매력적인 무용수는 단순히 뛰어난 기량 그 이상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끄는 예술가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성이라든가 오리지널리티겠죠. ‘이 사람의 어디가 매력적일까’ 하고 항상 생각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무대를 계속 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번 『스프링』은 『꿀벌과 천둥』과는 다르게 경쟁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하루랑 준이 〈겨울나무〉를 추는 장면이나 프란츠랑 로즈 아다지오를 추는 장면, 공항에서 하루가 네 사람에게 달려오는 짧은 시간 동안 쓰카사가 어린 하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프링』에서 하루가 마치 셰프가 레시피를 기억하듯, 자세를 취하면 안무를 만들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한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님도 혹시 쓰신 작품을 다시 읽으면 집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시나요?
네. 옛날 작품을 다시 읽으면 그때 무엇에 흥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네, 등의 감정이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의 작품처럼 느껴져 ‘지금이라면 이렇게 안 쓰겠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많은 동료 무용수가 등장하지만, 특히 준과 하루의 관계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라이벌도, 파트너도 아닌 이들의 관계를 선생님 에릭은 ‘보완 관계’에 가장 가깝다고 정의했는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루에게 있어 준의 역할이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재능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만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준과 하루도 둘이 만남으로써 각자의 발레의 어휘를 획득해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레를 위해 익힌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가 하루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무가와 무용가, 음악가에게 다른 분야의 예술, 특히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이나 인문학 등의 교양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하나를 깊게 파고들다 보면 다른 장르에서도 결국 같은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르의 융합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술, 연극, 음악, 발레 등 예술을 테마로 한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그 다음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있으실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음에 쓰고 싶은 분야는 없습니다만 백 년 정도의 긴 시간을 다루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작가님의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이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올해가 여러분에게 있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스프링
출판사 | 클레이하우스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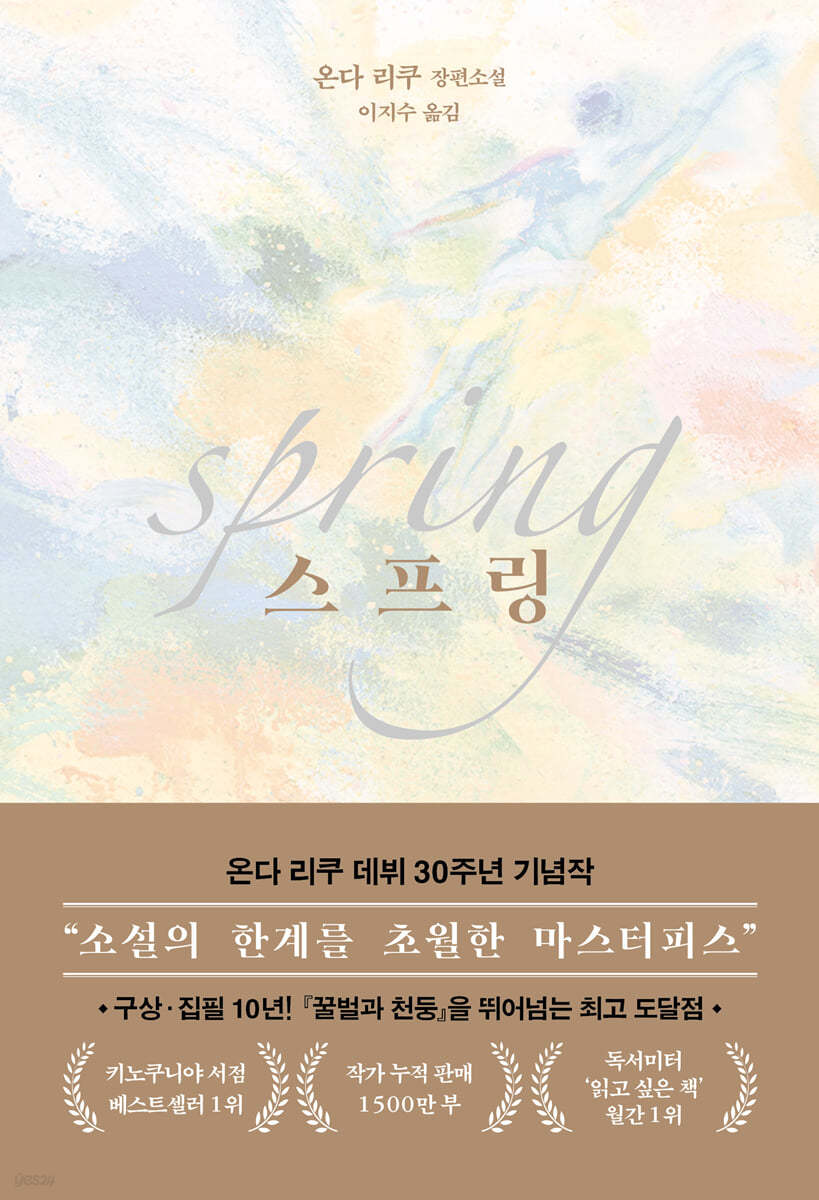
![[리뷰] 얼음 속에 깃든 온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1c47e469.jpg)

![[큐레이션] 저속 노화에 관심 있다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3-df64f2c6.jpg)
![[Read with me] 김나영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f468d247.jpg)